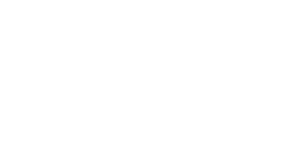[비즈한국] 3월, 마지막 학기가 시작됐다. 이상하리만큼 빨리 봄날이 온 것 같았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학교에 갔다. 유난히 사람들이 많았다. 17학번 새내기로 보이는 이들이 건물을 못 찾아 헤맸다. 한 친구가 와서 길을 물었는데, 바로 옆 건물의 위치를 물어보는 것이었다.
오랜만에 오는 학교라(두 달밖에 안됐지만) 거기가 어디지 멈칫하다가 가는 곳을 가리켰고, 그 친구는 싱그러운 표정으로 걸어갔다. 엄마미소를 지으며 뒷모습을 짧게 바라보았다. 17학번이라니…. 스물 다섯이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스무 살이라니! 내 나이가 ‘젊다’ 범위에 들어갔다면, 스물은 ‘어리다’는 말 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에 입학했을 것이라 생각하니, 그 때의 나는 어땠나, 잠시 추억에 잠기기도 하였다.

생각해보면 나는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한 편이다. 반수로 1년 늦게 들어온 뒤 중어중문학을 공부하다가, 신문방송학과로 전과했다. 국제통상학를 복수전공하고 있으며, 한 학기 휴학도 하고 한 학기 교환학생도 다녀왔다. 대학 내에서 할 수 있는 학적 변동은 다 겪은 것 같아 내심 뿌듯하다(?).
학적뿐만 아니라 미팅, 소개팅, MT, 연합동아리, 과소모임 등, 아 그리고 CC(캠퍼스 커플)까지. 크게 아쉬운 점은 없다. 내가 의자에 앉아 책만 파고 공부만 했다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었을 것이다. 역시 엄마가 공부하라고 할 때 ‘경험’이라는 명목으로 신나게 놀길 잘 했어. 새삼 나 자신을 우쭈쭈하고 싶어진다. 그럼에도 더 놀았어야 했다는 생각 밖에는 안 든다.
아무것도 무서울 것 없는 신입생 때 미친 듯이, 더 열정적으로, 내일이 없는 것처럼 놀았어야 한다. 다시 오지 않을 젊음이지 않은가. 지금도 젊고 당분간도 젊을 예정이지만 벌써 옛날이 그립다. 어쩌면 몇 년 뒤 지금을 그리워하고 있으려나. 지금 나이 들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서른 되기 전에 놀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말이다. 배움은 평생에 걸쳐 하는 거라는데 노는 것은 지금이 최적기인지도!

대개 마지막 학기에는 들어야 할 학점이 적은 것이 보통이다. 나의 경우에는 전과, 복수전공, 교환학생 등의 이유로 마지막 학기임에도 들어야 할 전공 과목이 꽤 됐다. 보통 한 학기 18학점 정도인데, 나의 마지막 학기는 12학점이었다. 과목당 3학점이며, 전공 혹은 복수전공 과목이다. 21학점을 들었던 학기에 비하면 널럴한 편이지만 앞서 말했듯 일반적이진 않다.
나는 신문방송학과로 전과할 만큼 방송, 언론에 관심이 많았지만 국제통상학 같은 상경계열에는 애당초 취미가 없었다. 그럼에도 국제통상학을 복수전공한 까닭은 언론사에 취직하지 못했을 때 일반기업에 가야 하기 때문이다. 전공불문이라지만, 상경계열 전공자들을 선호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나는 보험을 들고 싶었던 것이다.
국제통상학이라는 학문이 경영, 경제, 무역, 통상, 마케팅 등을 두루 배우는 터라 수업을 들으면서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참 여러 가지를 배운다고 생각했다. 막 수업을 듣기 시작했을 때는 회의감도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다. 신기하게도 수업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몰랐던 나의 재능과 흥미를 발견하고 있다. 특히 경제학이나 마케팅 관련 수업에서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집중력을 보이고 있었는데, 신문방송학 학점보다 국제통상학 학점이 높을 때도 많았다. 팀 프로젝트와 실무 관련 활동을 통해 깨우치는 것도 많았다. 다른 학생들도 주어진 미션에 열심히 참여했다.
문제는 수업의 질이었다. 미안한 말이지만 몇몇 강의는 어떻게 교수가 되었나 싶을 만큼 열정도 실력도 없었다. 모든 교수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 기억 속 몇 분의 수업 시간은 지겹고 괴로웠다. 다른 친구들도 전공필수 강의라서 버티는 눈치였다.
나는 수업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배울 것이 많고 잘 가르치는 교수님이 좋다. 성적을 잘 주고 안 주고를 떠나, 등록금에 걸맞은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강의는 시작 때마다 한숨을 쉬기도 했다. 정교수 임용이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일도 쉽게 벌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강사들이 항상 열심히 준비해와 존경스러웠다.
이번이 마지막 학기 인만큼 ‘빡세기로 유명한’ 교수님의 수업을 신청했다. 나름 패기 있게 내린 결정인데,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교수님께서 “매주 팀플이 있으니 알고 있으라”고 겁을 주었다. 이번 학기도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어쨌든 참 아쉽다. 이번 학기만 지나면 졸업이다. 더 이상 ‘대학생’도 아니고. 정말로 취준생(=백수)이 되는 것이다. 졸업 이후 벌어질 일은 많이 생각하지 않으련다. 안 그래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니까. 조금이라도 남은 대학생활을 신나고 스펙터클하게 보내고 싶다. 이왕이면 의미 있는 추억을 간직한 백수가 되고 싶으니까!
※필자는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어딘가 삐걱거리는 삶을 살고 있는 대학생으로, 거둬갈 기업 관계자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이상은 취업준비생 writer@bizhankook.com
[핫클릭]
·
미·중 사이에 낀 한국 경제, 오락가락 외교정책의 결과
·
10일 유력 운명의 날, 6일 ‘택일’ 가능성
·
[단독] 신세계몰, 식약처 판매정지 처분 제품 버젓이 판매중
·
자녀교육법 유명 부부, 사기사건 연루 구속 스토리
· [SNStar]
구독자 50만 ‘피아노 치는 남자들’ 정인서 대표




















![[단독]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일감 몰아주기 논란 '후니드' 지분 전량 매각](/images/common/list01_guide0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