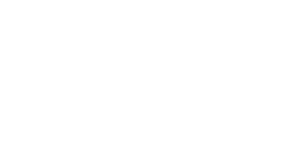[비즈한국]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에서 ‘비보’가 날아든다. “이번엔 ○○매거진이 정간했대. 사실상 폐간이지 뭐.” “A 기자랑 B 기자도 그만뒀대. 권고사직이래.” “이렇게 잡지 시장이 끝나는 건지, 이제 진짜 바닥인 것 같아.”
잡지는 사양산업이니, 종이매체의 위기니 하는 말들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요즘 들리는 소식을 보면 이제 그 말이 실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올해 초, 내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월간 여성지가 사실상 ‘폐간’한다는 뉴스를 듣고 한동안 헛헛한 마음을 어쩌지 못했는데, 최근에도 줄줄이 매거진들이 폐간되고 업계 선후배 동료들이 떠난다는 소식에 마음이 불편하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변화 속도가 유난히 빠른 우리나라이니 누군가는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탓이라고, 혹은 정해진 수순인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종이 매체만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 말한다면 나는 ‘옛날 사람’인 걸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독일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주는 편안함이 있다. 물론 편리하진 않다. 처음 베를린에 와서 아날로그 방식 때문에 겪었던 불편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인터넷이 느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업무는 전화나 이메일이 아닌 우편물을 통해 진행됐다. 자질구레한 공지사항도, 관련 서류도 우편으로 주고받으며 진행되니 ‘LTE급 속도’에 익숙해진 한국인은 답답할 수밖에.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 일 처리를 할 때도 디지털화되지 않은 방식 때문에 오랜 기다림은 필수다. 은행 계좌를 만들고 핀 넘버를 받아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기까지 한 달 가까이 걸렸으니 짐작하고도 남을 수준. 계좌 개설 후 일주일 만에 카드를 받고, 다시 일주일 뒤에 핀 번호를 받고, 그 뒤 일주일 만에 온라인 거래용 핀 번호를 우편으로 받으면서 ‘한국이라면 10분 만에 될 일을 왜 이렇게 하는지’ 불평했던 기억이 난다. 독일은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하기 때문에 도난에 대비해 따로 발송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처음 겪는 입장에선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
적응될 것 같지 않던 아날로그의 느린 속도도 살다 보니 익숙해졌다. 우편이 활성화된 나라인지라 길거리에서 매일 마주치는 우체부들도 반갑고, 편지봉투에 우표를 붙여 가까운 우체통에 넣는 별 것 아닌 일상도 새롭기만 하다.

어디 우편뿐일까. ‘전 세계 가장 큰 도서 시장을 보유한 나라’, ‘서유럽에서 가장 큰 신문 시장을 보유한 나라’라는 타이틀이 보여주듯 독일 사람들은 여전히 책과 종이매체를 사랑한다. 공원에서, 카페에서, 지하철에서 책이나 신문, 잡지 등을 읽는 모습은 흔하디 흔한 풍경이다.
아날로그 방식의 ‘읽기’가 일상화된 나라답게 동네 마트에서도 책, 신문, 잡지 등을 판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 잡지 몇 권을 장바구니에 챙겨 넣는 독일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전직 잡지 기자로서 부러운 마음이 든다.
독자가 많으니 시장 규모도 엄청나다. 2014년 기준 329개의 일간지와 20개의 주간지, 1590개의 잡지가 존재한다. 중앙지와 함께 지역 신문도 인기이고, 다양한 분야의 잡지들이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독자의 사랑을 받는 등 시장 형태 또한 건강해 보인다.
물론 독일 역시 디지털화로 인한 인쇄매체 시장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추세지만, 아직도 100만 부가 팔리는 잡지가 있을 정도이니 우리의 상황과 비교할 수 있을까.
한국에 돌아가면 빨라진 속도감에 허우적거리겠지만, 지금은 기꺼이 ‘느림의 미학’을 즐기리라. 이럴 땐 큰 변화를 반기지 않는 독일 사람들의 보수성이 다행으로 느껴진다.
글쓴이 박진영은 방송작가로 사회생활에 입문, 여성지 기자, 경제매거진 기자 등 잡지 기자로만 15년을 일한 뒤 PR회사 콘텐츠디렉터로 영역을 확장, 다양한 콘텐츠 기획과 실험에 재미를 붙였다. 지난해 여름부터 글로벌 힙스터들의 성지라는 독일 베를린에 머물며 또 다른 영역 확장을 고민 중이다.
박진영 칼럼니스트 writer@bizhankook.com
[핫클릭]
·
[실리콘밸리 게임회사에서 살아남기] 한국과 미국의 이력서
·
[인터뷰] '참기름 소믈리에'가 연남동에 방앗간 차린 까닭
·
[베를린·나] 독일의 학교는 늘 '슐튜테'처럼 달콤했다
·
[베를린·나] 에어컨·선풍기 없는 독일인 놀라게 한 폭염
·
[베를린·나] '여름휴가 한 달' 실화? 부럽기만 한 독일 직장인들




















![[단독] 현대리비트 '입찰담합' 191억 과징금 철퇴 이어 대표 '세금 지연납부'로 자택 압류 구설](/images/common/list01_guide0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