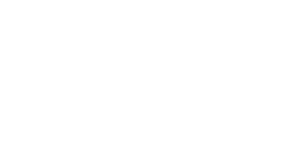[비즈한국] 찬바람이 분다. 여름이 하도 더웠던 탓에 잊고 있었지만 한반도에는 가을이 있고 겨울도 있는 것이다. 어정쩡하게 열어둔 창문으로 들이치는 찬바람을 반팔 티셔츠 차림으로 맞고 있는 어리석음은 분명 아직 폭염으로부터 돌아온 시차에 적응이 안 된 탓일 터다.
폭염 때문에 잊고 살았던 것이 가을과 겨울 말고도 있다. ‘경상도집’이라는 네 글자 이름이다. 이름만 적어도 벌써부터 군침이 꼴깍 넘어가는 연탄불 돼지갈비. 그 유일한 메뉴를 내건 식당이다.
이름만 적었는데도 벌써부터 을지로6가 국립중앙의료원 왼쪽 길을 100m쯤 걸어 새파란 플라스틱 테이블이며 엉성한 의자에 펄럭거리는 싸구려 천막을 세운 그 야외 자리에 앉아 가을바람을 맞고 있는 것만 같은, ‘야장’의 성지이다. 아, 야장은 표준어는 아니고 야외에 자리를 편 술집에서 마시는 행동 또는 그 모양새를 형용하는 은어 같은 것이다.

매주 일요일만 빼고 매일 11시부터 22시까지, 연탄불은 쉼 없이 탄다. 그 연탄불 위로 돼지갈비도 쉼 없이 구워진다. 연탄불은 은근하면서도 강한 화력원이라, 경상도집 돼지갈비는 끄트머리가 새까맣게 그슬릴 정도로 바삭하게 구워진다.
흰 멜라민 접시에 툭툭 쌓여 나오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도 ‘발암물질’ 운운하며 탄 데를 떼어내고 앉아 있는 사람은 여태껏 한 명도 없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꽤나 야비하고 비겁한 작자이거나 평생 불운에 잠겨 사는 희망 없는 인생이 아닐까 하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거나 말거나, 돼지갈비는 겉과 속이 반전이다. 연탄불이나 돼지갈비나 매한가지로 쉼 없이 고기를 뒤집는 부지런한 집게질 덕분에 속은 촉촉한 미디엄웰 정도다. 절묘하다. 향이 강하게 든 간장 양념은 꽤 달달한 편이지만, 그게 또 그리 달지만도 않다. 강력한 불 향과 함께 돼지 향, 양념의 복잡한 향이 뒤섞여 꽤나 완성도 있는 돼지갈비 요리가 된다.
백미는 단연 갈비임을 증명하기나 하듯 당차게 섞여 나오는 뼈인데, 살코기를 우아하게 다 집어 먹고 접시에 뼈만 남았을 때 우리는 배려나 양보 같은 단어를 잊게 된다. 남보다 재빨리 낚아채 뼈에 붙은 살점과 쫄깃한 근막을 와구와구 먹을 일이다. 뼈에 붙은 고기가 제일 고소하고 맛있으니 이기적일 필요가 있다.
돼지갈비를 찍어 먹는 빨간 양념 또한 캐릭터 있다. 콕 찍어 맵싸한 맛을 더하고, 상추에도 싸 먹고 청양고추도 얹어 먹고. 위의 용적을 시험하는 것처럼 끝도 없이 들어간다. 거기에 시큰둥하게 찬 온도로 나오는 맵싸한 콩나물국 한 술 떠먹으면, 내년까지도 질리지 않고 망부석처럼 앉아 돼지갈비만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가게에서는 1인분은 주문도, 추가 주문도 안 된다고 써 붙여 놨지만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서야 1인분만 주문하거나, 추가 주문할 수는 없다. 굽는 데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 1인분씩 추가해봐야 먹는 속도를 따라오질 못한다. 또 몇 인분을 시키더라도 한 번에 나오는 양은 2~3인분으로 정해져 있다. 찬 접시에 담아내니 따뜻할 동안 먹으라는 의미도 있고, 굽는 속도를 순서대로 모두가 기다리자면 모두가 고역이니 적당한 양을 돌리는 셈이기도 하다.
친절하지도 포악하지도 않은 접객에, 카드 결제는 아예 안 된다. 화장실이 있긴 하지만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태라 갈 때마다 여성들은 화장실을 참고 만다. 사실 맛으로 따지자면 연탄불 돼지불고기, 또는 돼지갈비 맛나게 하는 곳이야 굳이 경상도집 한 곳만도 아니다. 하다못해 새마을식당 프랜차이즈 고깃집에 가도 연탄불 돼지불고기는 언제나 준비된다.

그럼에도 꼭 경상도집을 봄가을, 심지어 겨울의 덜 추운 시기에도 일산화탄소결핍증 환자(그런 병은 없습니다)처럼 병적으로 달려가는 것은 도심 속이지만 하늘이 다 트인 시원한 야외 자리, 그리고 모나지 않고 소박한 그 느낌 자체에 있다. 그럼에도 경상도집에 대해 떠들고라도 싶어서 마감 전날 굳이 원고를 서둘러 쓰고 있는 것은 경상도집이 오늘, 일요일은 휴무이기 때문이고, 그 맛이 자꾸만 입안에 감돌아서이다.
아는 맛이 제일 무섭다더니.
필자 이해림은? 패션 잡지 피처 에디터로 오래 일하다 탐식 적성을 살려 전업했다. 2015년부터 전업 푸드 라이터로 신문, 잡지 등 각종 매체에 글을 싣고 있다. 10월 출간될 ‘탐식생활’ 등 몇 권의 책을 준비 중이며, ‘수요미식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먹는 이야기를 두런두런 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음식 관련 행사, 콘텐츠 기획과 강연도 부지런히 하고 있다. 퇴근 후에는 먹으면서 먹는 얘기하는 먹보들과의 술자리를 즐긴다.
이해림 푸드 칼럼니스트 writer@bizhankook.com
[핫클릭]
· [이해림 탐식다반사]
시간과 경험으로 완성한 유니콘급 귤 브랜디
· [이해림 탐식다반사]
반도 대신 광황, 가지마! 복숭아
· [이해림 탐식다반사]
조금 더 오래 맛보고 싶은 그 '조기찌개'
· [이해림 탐식다반사]
한여름의 미뉴에트, 콩국수 정경
· [이해림 탐식다반사]
그저 옥수수? 과일처럼 다루면 과일만큼 달다




















![[단독] bhc, 해임한 박현종 전 회장 딸 아파트에 '가압류'](/images/common/list01_guide0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