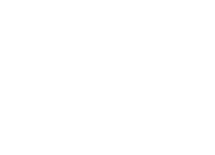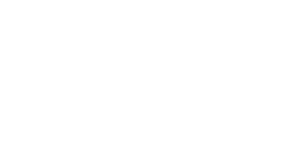[비즈한국] 얼마 전 이 칼럼에서 유럽 핀테크계의 효시로 여겨지는 장-밥티스트 데크르와 베르니에(Jean-Baptiste Descroix-Vernier)의 독특한 생애와 경력을 다룬 적이 있다. 오늘은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핀테크의 원조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카드를 발명한 롤랑 모레노(Roland Moreno, 1945~2012)를 소개하고자 한다. 모레노는 베르니에를 능가하는 괴짜이자 천재였다.
스마트카드는 IC카드라고도 부른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로는 손톱만 한 직접회로 (Integrated Circuit) 칩이 장착된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등을 들 수 있다. 휴대폰에 사용되는 SIM카드도 스마트카드의 일종이다. 지금은 대부분 IC카드로 바뀌었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마그네틱카드가 더 많았다. 당시 유럽에서는 이미 IC카드 사용이 일반화되어 마그네틱카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는 물론 교통카드, 건강보험카드, 사원증·학생증 등 각종 신분증에도 칩이 장착된 스마트카드가 사용되는 걸 보고 놀랐던 기억이 난다.

프랑스에서는 일찌기 프랑스통신공사(France Telecom)가 1980년 초반부터 전화카드로 스마트카드를 보급했고, 파리교통공사(RATP)는 교통카드를, 1988년부터는 금융기관들 또한 적극적으로 마그네틱카드를 IC카드로 교체했다. 이는 스마트카드 발명자가 프랑스인인 것과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마그네틱카드와 스마트카드의 결정적인 차이는 보안성인데, 개인정보 보안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유럽인의 성향도 한몫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롤랑 모레노는 1945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태어나 어릴 때 가족과 함께 프랑스로 이주했다. 잡다한 분야에 재주가 많았던 그는 학교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았다. 고교 졸업 후 정신과 의사가 되려고 의대에 등록을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자퇴했다. 이후 청소부, 푸줏간, 신문배달원, 외판원, 사회복지사 등 온갖 직업을 거쳐 추리물 전문 잡지의 수습 기자, 화학기술 전문지 부편집인 등으로 일했다.
전기 전자 기술에 흥미를 느껴 독학으로 틈틈이 공부한 그는 “쓸모 없는 전자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 보자”는 괴상한 목표를 세우고는 정말로 ‘무쓸모한’ 발명품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동전 던지기 기계, 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초소형 피아노, 손 안 대고 성냥 켜는 장치, 노래하는 전기새…. 의외로 이런 독특한 물건을 좋아하는 이들이 있어서 나름의 팬층을 형성했다.
그중에는 라도퇴르(Radoteur)라는 ‘헛소리 기계’도 있었다. 프랑스어로 ‘헛소리를 지껄인다’는 이름의 이 장치는 모레노가 고안한 알고리즘을 이용해 “왠지 그럴싸하게 들리는” 의미없는 단어들을 무작위로 쏟아내는 장치였다. 이 헛소리 기계는 쓸모가 없지 않았다. 기업들의 브랜딩과 네이밍을 컨설팅하는 회사에서 이 기술의 라이선스를 사들여 활용한 것이다.
모레노는 1973년 돈이 되는 사업을 해보고자 마음을 고쳐먹고 ‘아이디어를 파는’ 것을 사업 모델로 한 회사 ‘이노바트론(Innovatron)’을 설립한다. 1974년에 첫 특허를 출원했는데, 애초에 그가 구상했던 것은 스마트카드가 아닌 스마트 반지였다. 특허의 골자는 “기억 장치를 갖추고 특정 권한을 특정인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휴대 가능한 물체”로서 “오류를 판독하는 연산 장치를 갖출 것”이었다.

이는 유명한 시간여행의 패러독스(시간여행자가 과거로 돌아가 자신의 조상을 살해한다면 그의 존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최초로 제기한 프랑스의 SF 작가 르네 바자벨(René Barjavel)의 작품에서 착안한 아이디어였다. 스마트반지를 개발할 당시의 코드명은 TMR. 미국 영화감독 우디 앨런의 초기작 ‘돈을 갖고 튀어라(Take the Money and Run)’를 줄여서 부른 것이니, 그의 장난기가 대충 짐작이 될 것이다.
모레노는 가까운 미래에는 모든 사람이 몸에 부착되는 전자 장치를 통해 신분을 증명하고 금융 거래 등 경제 사회 생활을 수행할 거라고 믿었다. 말하자면 중세의 귀족들이 끼고 다니던 인장과 같은 것이다. 21세기의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열풍을 생각하면 그의 예측이 정확했다고 할 수 있으나, 1970년대 초에는 이렇게 괴상망측한 장치를 손가락에 끼고 다닐 만큼 대담한 사람은 없었다.
한계를 간파한 그는 이듬해인 1975년 반지가 아닌 카드에 IC칩을 부착하고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판독기를 통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억 장치가 딸린 연산 장치”라는 조건을 덧붙여 다시 특허를 신청했다. 스마트카드의 탄생이었다. 이후 프랑스텔레콤을 필두로 많은 기업과 조직이 스마트카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1992년에 프랑스는 모든 금융 카드를 스마트카드로 교체하기에 이른다. 같은 해 모레노는 프랑스 최고의 영예인 ‘레종도뇌르’ 훈장을 서훈 받고, 아이들의 보드 게임에까지 등장하는 등 프랑스 테크계의 스타로 부각된다.
스마트카드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1985년부터 1995년까지 프랑스와 유럽에서는 약 5억 장의 스마트카드가 판매되었다. 이를 통해 모레노와 그의 회사는 약 1억 5000만 유로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수익을 그다지 현명하게 관리하지는 못한 듯하다. 1994년에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서 라이선스 수익이 줄어들자 회사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모레노는 회사 자체나 수익에 그리 큰 애착은 없었던 듯, 회사와 권리를 인제니코(Ingenico)와 젬플러스(GemPlus) 등 관련 회사들에게 서둘러 매각해버렸다. 이 회사들은 이후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비접촉 기술을 개발하는 등 스마트카드 기술을 전 세계에 보급하고 키워 나갔다.
모레노는 발명가로서뿐 아니라 작가, 요리사, 심지어 코미디언으로서의 재능까지 과시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1990년에 발간한 문예 비평집 ‘Théorie du bordel ambiant’는 발명가로서의 그의 명성과 무관하게 베스트셀러로 등극했다. 그는 로르 디나퇴르 (Laure Dynateur: 프랑스어로 컴퓨터를 뜻하는 l’ordinateur와 발음이 같다)라는 필명으로 요리책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책을 집필했다. 성격과 외모에서 드러나듯 모레노는 ‘괴짜 발명가’, 심지어 ‘미친 과학자’의 이미지가 강했는데, 몇몇 영화나 대중 매체에 그런 캐릭터로 출연해 코믹한 연기력을 뽐내기도 했다.

시대를 풍미한 기술이 대개 그러하듯, 스마트카드의 발명자가 누구냐를 두고도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와 유사한 개인 식별 및 암호화 장치에 대한 연구는 당시 유럽의 많은 기술자들이 연구하던 주요 테마 중 하나였다. 다만 모레노는 가장 먼저 특허를 출원했고, 연관된 50여 개의 특허 또한 보유했다. 이후 이 기술의 소유권을 놓고 몇 차례 소송에 휘말렸으나, 법원은 결국 모레노의 손을 들어주었다.
특허를 출원하고 소송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고 나서도, 고객과 시장을 설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쩌면 스마트카드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기까지 10년 가까운 인고의 세월 동안 모레노를 버티게 해준 원동력은 낙천적인 성격과 유머 감각이 아니었을까?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스타트업 창업가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끝까지 버티는 능력, 즉 ‘존버’ 정신이다. 그리고 최후의 승자는 즐기는 사람이기 마련이다. 일찌기 공자도 노력하는(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필자 곽원철은 한국의 ICT 업계에서 12년간 일한 뒤 2009년에 프랑스로 건너갔다. 현재 프랑스 대기업의 그룹 전략개발 담당으로 일하고 있으며, 2018년 한-프랑스 스타트업 서밋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고 기재부 주최로 열린 디지털이코노미포럼에서 유럽의 모빌리티 시장을 소개하는 등 한국-프랑스 스타트업 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곽원철 슈나이더일렉트릭 글로벌전략디렉터 writer@bizhankook.com
[핫클릭]
·
[유럽스타트업열전] 60대 CEO의 '수소 스타트업' 에르고숩
·
[유럽스타트업열전] 유럽 최대 클라우드 기업 일군 '엔지니어 집안' 비사
·
[유럽스타트업열전] SK텔레콤·삼성전자도 투자한 IoT 기업 '시그폭스'
·
[유럽스타트업열전] 소액결제 시스템 만든 천재의 기이한 삶
·
[유럽스타트업열전] '배달의민족'과 프랑스 헬스케어 '닥터립'의 공통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