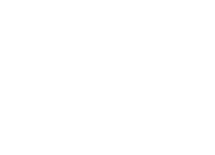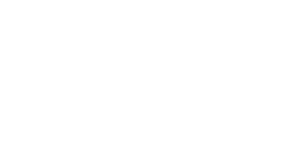“이별 장면에선 항상 비가 오지. 열대 우림 기후 속에 살고 있나.”
<이별공식>이 발표되고 약 20년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의 여름은 이별 장면뿐 아니라 거의 모든 순간이 열대 우림 기후로 변했다. 일요일인 지난 24일도 평소와 다르지 않아 습도 80%에 달하는 찌는 더위는 계속됐다. 그런데 이 여름 한복판, 기자는 쉐이크쉑버거(쉑쉑버거)라는 새로운 햄버거집 앞에 줄을 섰다.
 |
||
| 쉑버거 더블의 위용. | ||
모든 문제가 그렇듯 이번에도 데스크가 발단이었다. 메신저로 다른 매체에서 보도한 쉑쉑버거 글을 링크로 보내는가 하면, “먹고 기사 쓰면 햄버거값은 내가 준다”고 꼬여냈다. 속으로 ‘그래. 돈 주고도 줄 서며 먹는데 얼마나 맛있나 맛이나 보자’는 생각으로 강남역 앞으로 향했다. 그래도 한가한 날짜를 골라봤다. 주말 중 시간대를 골라보니 역시 일요일 저녁을 약간 지난 시간. 이때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알려진 대기 시간은 약 3시간. 어린이날 놀이공원 롤러코스터처럼 길고, 롯데리아의 모짜렐라 인더버거 치즈처럼 늘어지는지라 혼자 기다리기 두려울 지경이었다. 인근에 있다는 친구를 섭외해 같이 줄을 세웠다. 세상사에 관심이 없어 쉑쉑버거의 대기시간을 모르는 게 다행이었다. 강남역에서 쉑쉑버거로 이동하면서 메시지가 왔다. “설마 사람 엄청 많은 저긴가?” 그래 저기야. 너와 나의 연결고리는 이곳이야. 정확히 2016년 7월 24일 오후 7시 14분, 쉑쉑버거 줄 맨 끝에 가서 섰다.
 |
||
| 기다리는 사람은 셀카를, 구경하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다. | ||
시간차 공격 전략을 잘 세웠는지 줄은 길지 않았다. 물론 ‘줄이 길지 않다’는 상대적 개념이다. 쉑쉑버거의 커다란 빌딩을 이무기처럼 한 바퀴 감았다는 대기 줄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쉑쉑 정면을 보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다는 후기와 다르게 시작부터 등짝이 아닌 정문을 볼 수 있었다. 줄 선 사람들을 보니 둘 이상이 같이 기다리며 서로 재잘거리기 바빴다. 셀카를 찍어 쉑쉑버거 ‘인증사진’을 SNS에 부지런히 올리는 사람도 많았다.
셀카를 찍는 사람들을 다시 카메라에 담는 사람들도 보였다.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신기한 듯 쳐다보는 걸 넘어 사진을 찍는 사람이 많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찍는 걸 넘어 한 마디 보태는 경우도 있었다. 그 한 마디는 대개 “이해가 안 간다” “뭐 대단하다고” “뭐만 생기면 우르르 몰려다닌다”를 넘어 “미개하다”까지 달했다. 기다리는 사람은 셀카를, 구경하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고, 서로를 찍는 모습을 다시 방송사에서 거대한 카메라로 담았다. 동물원 원숭이가 된 기분도 들었다. 그저 햄버거 하나 먹고 싶었을 뿐인데….
 |
||
| 디저트 메뉴인 ‘콘크리트’ 메뉴에 대한 설명. 그중 ‘강남’도 보인다. | ||
대기시간 50분 정도가 지나자 정문이 닿을 듯 가까워졌다. 2시간 30분~4시간까지 걸린다는 이야기는 이제 하나의 민화나 전설이 되는 건가. 오래 서 있던 탓에 땀이 쏟아지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땀 냄새도 심해졌다.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을 넘어서자 문 바로 앞까지 왔다. 마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는 느낌. 아스라이 먼 별 같던 저 문이 이제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 강남찜통 한가운데서 보기엔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 햄버거를 먹는 저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듯했다. 한 발짝 안이지만 매장 저 안은 천국, 매장 밖은 지옥이었다. 햄버거는 이제 됐다. 그냥 저 안에서 에어컨 바람만 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
||
| 2명이 주문해 4만 원에 도달했다. | ||
드디어 주문할 수 있는 카운터로 들어왔다. 문 하나 사이로 천국과 지옥이 갈렸다. 카운터 뒤쪽으로는 다국적의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은 간간이 이상한 구호를 외치고 서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토종브랜드 맘스터치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게 ‘뉴욕의 맛’인가. 토종 한국인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문화다.
직원 교육의 힘인지 카운터 직원도 한국의 시크하고 무심한 표정과 달리 활기차고 씩씩했다. 한국인이 보기엔 과잉된 몸짓과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한다.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말하는데도 뉴욕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런 게 ‘뉴욕의 멋’인가 싶었다.
 |
||
| 감자튀김에 치즈를 얹은 ‘치즈프라이’. | ||
다른 건 그렇다치고 강남이 도대체 뭔가. 메뉴 이름이 특이하다 보니 한국 특화 메뉴(누가 봐도 그렇겠지만)로 보였다. 쉑쉑에 줄을 서는 사람들은 뉴욕을 느끼러 왔을 텐데 강남을 주문할 리는 없을 것 같다. 기자도 내 돈이었다면 절대 사먹지 않을 메뉴이리라. 이번 기회에 한 번 먹어보자는 생각으로 주문했다. 후에 강남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 SPC 측에 전화로 문의했다. “쉑쉑버거는 새로운 도시에 매장을 낼 때 그 도시에서만 맛볼 수 있는 메뉴를 추가한다. 그게 한국에서는 강남이다”라고 설명했다. 주문은 끝났다. 모든 메뉴를 통틀어 가격은 4만 원이 나왔다.
주문을 하고 보니 매장은 생각보다 훨씬 컸다. 물론 밖에 아직도 줄 서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한참 적지만 회전율이 높은 패스트푸드라 그런지 자리는 많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약 10분쯤이 흘러서 드디어 진동벨이 울렸다. 줄을 선 지 약 1시간 20분이 지났을 때였다. 햄버거를 받아들었다. 생긴 건 독특하다. 수제라 그런지 패티가 제멋대로 튀어나와 있다.
 |
||
| “기다리면서 욕 나왔는데 맛있긴 하네.” 패티의 맛은 확실히 상상 이상이었다. | ||
일단 한 입 베어물었다. 이번엔 친구의 표현을 빌리자. “기다리면서 욕 나왔는데 맛있긴 하네. 햄버거 패티는 패스트푸드라 분류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 번 줄세웠다고 인연 끊길 뻔했는데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었다. 패티의 맛은 확실히 상상 이상이다. 살아 있는 느낌이 든다. 쉑스택은 쉑버거 베이스 중간에 버섯 튀긴 게 들어 있다. 다만 ‘맛알못’(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기엔 쉑버거 더블이 더 맛있어 보였다.
쉑쉑의 자랑이라는 감자튀김은 예상보다는 그저 그랬다. 입맛이 싸구려일 수도 있겠지만 치즈까지 뿌려 놓은 감자튀김은 너무나 느끼해 다 먹지 못하고 남겼다. 밀크셰이크가 필수인 이유도 그때 알았다. 햄버거, 감자튀김 등이 너무 짜서 어쩔 수 없이 밀크셰이크를 마시고, 그럼 또 너무 달아 다시 햄버거를 입에 문다. 극단적 ‘단짠단짠’, 이게 바로 뉴욕의 맛이구나 싶었다. 아직까지도 단짠단짠의 기억만큼은 강렬하다.
문제의 강남.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메뉴. 일단 조합이 괴상하다.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딸기잼을 몇 스푼 퍼 넣어준 데다 비스킷을 올렸다. 속는 셈치고 한 숟갈 떠먹어봤다. 딸기잼만 입에 들어갔다. ‘안 되겠다, 잘 섞어야겠다’고 마음먹고 휘휘 저었다. 색깔이 마치 새벽 5시 강남역 이곳저곳에 흩뿌려져 있을 그 무엇 같았다. ‘도대체 이런 조합을 왜 한국을 위해 만들었나’라는 의문은 그 색깔을 보는 순간 해결됐다. 아 이게 바로 강남의 맛이구나.
 |
||
| 문제의 강남.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딸기잼을 몇 스푼 넣고 비스킷을 올렸다. | ||
전체적으로 평을 해보자면 개인적으로 보기에 햄버거 맛은 만족, 사이드메뉴는 보통 수준이다. 아마 단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좀 더 후하게, 담백한 음식을 좋아한다면 좀 더 박한 평이 나오리라. 다만 담백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쉑쉑버거에 2시간 넘게 줄을 서진 않을 테니 아마 후한 평이 더 많을 것으로 본다.
입안 가득 기름기를 느끼며 쉑쉑버거 정문을 나와 다시 밖으로 향했다. 9시를 향해가는 시간에도 사람이 구름떼처럼 모여 있었다. 쉑쉑은 어디로 갈까. 뜨겁게 타올랐다 철수한 브랜드들의 명단에 한 줄을 추가할까, 아니면 20개 이상의 매장을 내겠다는 SPC의 계획대로 또 하나의 국민 브랜드의 길로 갈까. 찌는 더위 속에 친구는 내게 말했다.
 |
||
“둘이 먹는데 패스트푸드 세트메뉴 8개 가격이 나오다니. 쉑버거 단품은 줄 안 서면 먹을 수 있는데, 줄 서면 또 먹으러 가진 않을 거야.”
더위가 절정을 향해가는 여름 한가운데에서 쉑쉑버거 간판 불은 반짝이고 한동안 그 열기도 꺾이지 않을 것 같아 보였다.
김태현 기자 toyo@bizhankook.com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