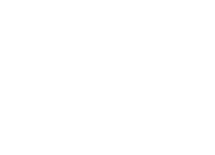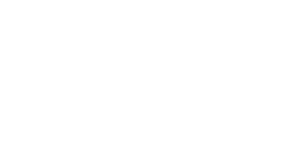삼성그룹의 건설 계열사 합병안이 다시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다. 삼성중공업이 구조조정 궁지에 몰린 가운데 삼성엔지니어링·삼성물산(건설부문)도 실적 부진에 시달리며 중복 사업의 대대적인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등기이사로 취임하면서 경영 승계를 염두에 둔 조직 개편이 가시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시장은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미 2008년과 2014년 두 차례 합병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기업가치 훼손 및 주가 하락을 우려한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그러나 원샷법은 합병 절차 및 기간을 단축해주는 절차간소화 특례 조항이 있어 주주 반대의 우려는 높지 않다.

상법은 합병에 반대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20일로 규정한다. 하지만 원샷법은 이를 10일로 단축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주식매수 의무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줬다. 소액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회사로선 주식을 매수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삼성중공업은 현금 등 자금 여력이 부족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부담을 느껴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원샷법을 이용해 부실 자회사나 성장성 낮은 사업부문의 매각 부담을 낮출 수 있다”며 “공급과잉 업종인 조선·철강·화학 업종의 체질 개선에 일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당장 경영상의 어려움은 2000년대 후반 낮은 가격에 수주한 플랜트·건설장비 탓”이라며 “계열사 간 중복 사업부와 과잉투자된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크다”고 전했다.
문제는 시점이다. 합병이 무산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다른 회사들의 원샷법의 적용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섣불리 움직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대영 삼성중공업 대표는 “당장 삼성엔지니어링과 재합병을 추진하기 보다는 독자 생존이 우선”이라며 “삼성엔지니어링의 기술력은 삼성중공업에도 필요하니 조금 더 (제반 여건을)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현황과 철강·화학 등 업종의 인수·합병(M&A)의 진행 양상을 보고 합병 방향·방법을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삼성중공업이 실적 악화와 최악의 수주절벽에 시달리고 있어 당장 합병을 시도하기엔 오너·경영진의 명분이 서지 않는다. 삼성중공업은 11월 유상증자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인 등 자체적인 체제 정비에 나선다.

원샷법 시행으로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삼각합병 길도 열렸다. 아직까지는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가능성이 높다. 삼각합병이란 인수 기업이 자사의 주식 지급을 대가로 피인수 회사의 특정사업부문을 분리, 자회사에 붙이는 합병 방식을 뜻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삼성엔지니어링 지분을 취득한 뒤 그 대가로 엔지니어링 주주에게 삼성물산 주식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주요주주인 이 부회장으로선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의 지분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 삼각합병은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어 소액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우려가 없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원샷법 시행으로 기업의 합병과 분할, 자산 양수도가 용이해졌다”며 “조선·건설·화학·중공업 등 업종의 자회사를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함으로써 모회사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권 승계에 원샷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나, 삼성으로선 이 부회장 체제를 강화하고 경영권 승계로 연결하기 위한 여러 수단이 열린 셈이다.
김서광 저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