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5월 1일은 노동절이자 근로자의 날이다.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대한민국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고 있을까. 다행스럽게도 최근 10년 새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노동자 수와 금액은 크게 증가했다.
재정과 정책을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작성 김민수 책임연구원)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산재보험 급여 지급 현황을 분석해 산업현장의 안전 실태와 노동자 보호 수준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4년 25만 2106명에서 2023년 39만 8324명으로 58.0% 증가했다. 총 지급금액은 2014년 약 3조 9000억 원에서 2023년 약 7조 3000억 원으로 85.5% 증가했다.

#전체 지급인원 증가하는데 상병보상급여만 감소세
산재보험급여에서 가장 비중이 큰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4년 16만 8566명에서 2023년 29만 7512명으로 12만 8946명(76.5%) 증가했다. 연평균증감률은 6.5%로 전체 급여 평균(5.2%)보다 높았다.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13.7%, 13.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22년에는 -0.1%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3년에 다시 2.2% 증가했다.
휴업급여는 2014년 11만 843명에서 2023년 16만 9728명으로 5만 8885명(53.1%) 증가했다. 연평균증감률은 4.8%였다.
장해급여(일시금·연금)는 2014년 9만 3719명에서 2023년 11만 5515명으로 2만 1796명(23.3%) 증가했다. 연평균증감률은 2.4%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유족급여(일시금·연금)는 2014년 2만 4103명에서 2023년 3만 6393명으로 1만 2290명(51.0%) 증가했다. 연평균증감률은 4.7%로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상병보상연금은 급여 가운데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4년 5058명에서 2023년 3231명으로 1827명(-36.1%) 감소했다. 연평균증감률은 -4.9%였다. 모든 연도에서 일관되게 감소세를 보였으며, 특히 2023년에는 -7.9%로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장례비는 2014년 2169명에서 2023년 2456명으로 287명(13.2%) 증가했다. 연평균증감률은 1.4%였는데, 연도별 변동이 큰 편이었다.
간병급여는 2014년 5487명에서 2023년 4725명으로 762명(-13.9%) 감소했으며, 연평균증감률은 –1.6%였다.
직업재활급여는 2014년 4245명에서 2023년 3046명으로 1199명(-28.2%) 감소했으며, 연평균증감률은 -3.6%였다. 연도별 변동이 매우 컸는데, 2019년에는 21.2%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20.1%로 크게 감소했다.
#10년 새 총 지급액 85% 증가
산재보험 총 지급금액은 2014년 약 3조 9000억 원에서 2023년 약 7조 3000억 원으로 약 3조 3584억 원(85.5%)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7.1%를 기록했다. 특히 2018년에는 전년 대비 약 5979억 원 늘어 13.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요양급여는 2014년 대비 2023년에 약 7781억 원(105.1%)이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8.3%를 기록했다. 2018년과 2020년에는 각각 20.3%와 20.7%로 증가율이 매우 높았다. 2022년 -3.2%로 유일하게 감소했다가 2023년에 15.4%로 다시 올라갔다.
휴업급여는 2014년 대비 2023년에 약 1조 854억 원(139.3%)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0.2%였다.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병보상연금은 2014년 대비 2023년에 약 227억 원(-13.6%)이 감소해 연평균 -1.6%의 감소율을 보였다. 급여 가운데 10년간 유일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증가율 4.9%를 기록하며 반등했다.
장해급여는 2014년 대비 2023년에 약 1조 323억 원(61.9%)이 증가해 연평균 5.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 산재 급여 가운데 금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족급여는 2014년 대비 약 4678억 원(98.1%)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 7.9%를 보였다. 일시금보다 연금 형태의 지급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연금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례비는 2014년 대비 약 118억 원이 증가해 48.3%의 증가율을 보였다.
간병급여는 2014년 대비 약 31억 원이 감소해 -5.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병보상연금과 함께 10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에 증가율 1.8%로 소폭 반등했다.
직업재활급여는 2014년 대비 약 87억 원이 증가해 52.0%의 증가율을 보였다.
#급여별 1인당 지급액 중 휴업급여 급증
1인당 보험급여는 2014년 1557만 5033원에서 2023년 1828만 8984원으로 271만 3951원이 늘었다. 총 증가율은 17.4%, 연평균 증가율은 1.8%였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8.2%)에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고, 2021년(-2.4%)에 가장 많이 감소했다.
1인당 요양급여는 2014년 439만 3376원에서 2023년 510만 4616원으로 71만 1240원이 늘어나서 16.2%가 증가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감소세였다가 2018년 13.3%로 크게 증가했고, 이후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다가 2022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1인당 휴업급여는 2014년 703만 1407원에서 2023년 1098만 6855원으로 395만 5448원이 늘어나 56.3%가 증가했다.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높은 증가율(56.3%)을 보이며,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 ‘산재보험 확대’ 이후 큰 폭 증가
산재보험 급여 지급 규모와 수급자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특히 2018년 이후 증가세가 가팔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를 제도적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2018년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출퇴근재해 산재 인정범위도 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2022년 6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2023년 7월 1일 시행) 등도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2023년 산업재해 요양재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분석 결과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2020년부터 2021년에 보험급여와 요양급여 지급이 줄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이것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의료 이용 패턴의 변화나 경제 활동의 위축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보험급여와 요양급여에서 약 3~4년 주기의 등락이 관찰되는 점은 정책 변화, 경제 상황, 또는 제도적 요인과의 연관성을 시사한다”며 사회안전망의 효율적 운영과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공공 가치 실현을 위해 산재보험 지급 현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자체의 제도적 관심과 환경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노동자가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 통합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맞춤형 산재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https://narasallim.net/report/743
김남희 기자
namhee@bizhankook.com[핫클릭]
·
'그놈'은 금융사기 취재하는 기자까지 사칭했다
·
[단독] '주주들 반발 의식했나' KG그룹 2세 곽정현, 핵심계열사 사내이사 사임
·
[중대재해처벌법 3년] 오늘도 건설 노동자가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
"비용 줄이려 무등록업체에 하청" 공사비 오르자 불법 하도급 급증
·
"이것 발동한 삼성물산만 감소" 5대 상장 건설사 산업재해율 따져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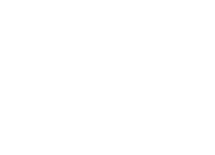
![[단독] 싸늘해진 미술품 조각투자 시장…테사, 키움증권과 '결별'](/images/common/side01.png)
![[단독] '대장동' 남욱 회사 강남 땅, 성남시가 항고 끝에 400억 가압류](/images/common/list01_guid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