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2016년 LG전자 스마트폰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바로 G5입니다. 최초의 모듈형 스마트폰이죠. 저는 당시에 바르셀로나 MWC 현장에서 신제품 발표회와 제품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모듈 때문이죠. 신기해서요? 아뇨. 이게 바로 ‘하드웨어의 플랫폼화’의 한 방향이었거든요.
자, G5는 많은 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제품 아랫부분이 분리되는 형태의 스마트폰이죠. 분리되는 부분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모듈이고, 모듈을 분리해서 배터리를 뺄 수도 있는 획기적인 구조였습니다. LG전자는 G5를 발표하면서 B&O와 협력해서 32비트 오디오 DAC 모듈과 카메라 제어 모듈을 내놨습니다. 하드웨어로서 기술의 포인트를 너무 잘 잡은 거죠.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프로젝트가 됐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하드웨어 플랫폼 시도는 좋았다, 하지만…
플랫폼의 중요성은 많은 기업이 알고 있죠. 하지만 플랫폼이 꼭 소프트웨어 기업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G5는 하드웨어의 플랫폼 화였어요. 당시에는 삼성전자도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플랫폼을 하려고 ‘타이젠’이나 ‘밀크’같은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운영체제, 서비스 등을 엄청나게 밀 때였어요. 그런데 다 실패했죠. 완성된 플랫폼을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운영체제로 생태계 만드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PC시장 꽉 잡은 천하의 마이크로소프트도 쓴잔을 들었던 게 모바일 플랫폼입니다.

안드로이드를 운영체제로 쓰는 스마트폰들은 사실상 제조사별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할 만큼 차이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별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하드웨어 자체를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G5가 그런 형태죠. 모듈화된 부품을 바꾸면 기능이 더해집니다.
당시에는 구글의 완전 모듈형 스마트폰 이야기가 나오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블록처럼 프로세서부터,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 모든 요소를 조각낸 제품이죠.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이 프로젝트는 빛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LG전자는 그걸 아주 현실적인 방법으로 풀어낸 겁니다. ‘기능’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여기에 뭔가를 붙이면 새로운 경험을 더하는 겁니다. 2부에서 스마트폰에 소프트웨어를 통해 많은 기능을 더하려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었죠. 왜냐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들은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가 동반되는 기능들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32비트 DAC을 붙이면 더 고음질의 음원을 더 좋은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걸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나요? 절대 안 되죠. 하지만 고음질이라는 확실한 경험을 줍니다.
하드웨어 없이는 만들어내기 어려운 차별점이죠. 카메라 제어 모듈은 사진을 다르게 만들진 않지만, 사진을 찍기 편하게 만들어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에 기대했던 것은 더 화질이 좋은 카메라 모듈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소니를 비롯해 외장으로 붙이는 카메라들이 꽤 나왔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적어도, 서서히 자리를 잡고 생태계가 커지고 인터페이스가 더 좋아지면 보조 프로세서나 GPU, 혹은 요즘의 머신러닝 코어 등을 더하는 것도 터무니없는 상상은 아닐 겁니다. 기본 모델은 싸게 팔고, 추가 기능을 모듈로 팔면 늘 LG전자를 괴롭히던 가격 이슈를 제품 하나로 모두 풀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가장 큰 강점, 바로 이 하드웨어가 소비자를 잡는 미끼가 되는 겁니다. 보통 락인이라고 부르죠. 만약에 모듈을 한 5개 갖고 있는 이용자가 있는데, 다음 세대 신제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존 모듈을 다 정리하고 다른 브랜드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모듈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같은 브랜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앱 마켓에 잔뜩 사 둔 앱 때문에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을 오가지 못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G5는 하드웨어 회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가장 어려운 도전을 한 겁니다.
#기대와 달랐던 시장 반응, 아쉬웠던 끈기
그런데 G5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듈 때문에 손해 본 하드웨어의 완성도가 있었겠죠. 초기에 꽤 많은 지적을 받았던 부분인데, 모듈이 유격이 있어서 덜렁거린다는 불만들이 나왔죠. 뺐다 끼웠다 한다거나 접었다 폈다 하는 기구는 반드시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고, 조립 마감이 성패를 가릅니다. G5는 그 부분에서 ‘탄탄하다’는 인상을 주지 못했어요. 이거 하나로 제품의 이미지가 확 달라지죠. 제품의 핵심요소인 모듈이 ‘허술한 마감’이 된 셈입니다.

효용성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모듈은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LG는 G5와 친구들이라고 모듈을 알리기도 하고, API나 생태계 관련 발표도 했습니다. 사내에서 아이디어도 활발하게 모았어요. 그런데 제품이 한 개도 안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정확한 내부 사정을 알 수 없지만, LG전자가 모듈을 두고 너무 신중했던 걸까요? LG전자는 일단 자체적으로, 또 외부 기업들이 활발하게 액세서리를 찍어내게 했어야 해요. 돈을 줘서 아이디어를 받고, 스타트업을 위해서 직접 공장 돌려서 손해 봐도 파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모듈의 재미를 맛보게 했어야 해요. 그게 생태계의 투자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제품이 없었습니다. 악순환이 일어나는 상황인 거죠. 모듈의 역할과 수요, 그리고 이를 통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LG 외의 액세서리 기업들이 느낄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보다는 ‘내년에는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불확실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놀립니다. “액세서리 또 안 나오냐?” 할 말이 없죠. 이게 브랜드 충성도를 건드리는 거죠. 앞에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속으로는 모듈형 스마트폰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모듈에 돈 쓰지 말고, 그만큼 값을 내리라’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G5의 모듈은 재미도, 충성도도, 플랫폼도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실패를 아주 빨리 인정합니다. LG전자는 G5가 한창 판매되던 시기에 다음 세대에 모듈을 이어서 쓸 수 있냐는 질문들에 속 시원하게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G6에는 모듈을 없앤다는 메시지를 준 거죠. 개발부터, 금형 제작, 생산, 유통 등 하드웨어는 쉽지 않은 일이고, 부담도 큽니다. 특정 제품만을 위한 액세서리를 만들어내려면 플랫폼을 제공한 기업이 확신을 주어야겠죠. 그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모듈이 나올 이유가 없어진 셈입니다.
불편한 부분들을 가다듬어서 한 번만 더 가봤으면 어땠을까요? 물론 이 모듈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품의 디자인을 제한해버린다는 거요. 모듈 형태 때문에 연결부의 모양을 못 바꿉니다. 화면 크기, 두께 이런 걸 하나도 손대지 못합니다.
#한 번만 더 해봤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좀 똑같이 생기면 어떤가요? G5의 디자인이 못생겼나요? 아니에요, 잘 나왔어요.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으면서도 디스플레이에서 뒤판으로 연결되는 형태가 일체감이 있습니다. 배터리를 아래로 빼는 아이디어 덕분이었어요. 화면이 작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다음 세대에 디자인을 바꾸기보다는 가다듬어서 완성도를 높이고, 디스플레이 더 좋은 거로 바꾸고, 카메라 더 좋게 하면 됩니다.
디자인 그대로여도 팔립니다. 스마트폰의 디자인은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왔던 시기이고, 바르셀로나에서 같은 날 발표된 삼성전자 갤럭시S7도 갤럭시S6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주력했던 가상현실 서비스, 그러니까 기어VR에 꽂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누구도 그 디자인이 낡았다고 폄훼하지 않았습니다.

모듈의 포기는 G5를 샀던 소비자들을 함께 버린 셈입니다. 플랫폼은 투자가 필요하고, 그 투자는 돈뿐만 아니라 시간과 마음에도 해야 합니다. 믿음을 사야 하는 거죠. 그걸 1년 만에 버린 건 애초에 플랫폼을 바라보는 판단이 너무 급했고, 내부적으로 포기가 맞는 방향이었다면 애초에 G5와 모듈을 개발하는 결정이 경솔하게 이뤄졌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G5 1세대 모듈의 단점들, 예를 들어서 내부에 아주 작은 배터리를 하나 심어서 전원을 끄지 않고도 모듈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거나, 유격이 생기지 않는 정밀한 디자인 같은 것들이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디자인을 강제하지 않거나, 영향을 덜 주는 형태의 내장형 모듈 같은 것도 함께 고민했으면 어땠을까 아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G6는 그렇게 나왔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G를 무난한 슈퍼 노멀 중심의 모델로 두고 V20에서라도 이어갔어야 합니다.
LG전자의 또 다른 주력 제품인 V 시리즈도 짚어볼까요. V는 G 프로 시리즈의 뒤를 이어 나온 제품입니다. 프로가 화면 크기로 차별화를 두었는데, 이미 스마트폰의 화면이 너무 커져서 더 큰 스마트폰을 구분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갤럭시 노트는 펜이 남아 있긴 하지만 지금에 와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LG전자는 그 고민이 더 빨리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걸 V10으로 풀어냅니다. 화면 크기가 아니라 LG전자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 새로움과 혁신을 녹여내는 브랜드가 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좋은 결정이었고, 잘 풀어낸 브랜드입니다. 소비자들도 일찍 알아본 제품들이 바로 V 시리즈였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하드웨어로서, 기술의 엘지에 대한 기대가 시작됩니다.
※4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최호섭 칼럼니스트
writer@bizhankook.com[핫클릭]
·
[LG스마트폰 잔혹사]② "얼마나 잘했는G, 그땐 미처 알지 못했G"
·
[LG스마트폰 잔혹사]① "그건 아마 맥킨지의 잘못은 아닐거야"
·
[구글세 30% 내막]③ 국경없는 플랫폼 시대, 규제와 국룰 사이
·
[구글세 30% 내막]② K-규제가 전 세계 마켓에 쏘아올린 작은 공
·
[구글세 30% 내막]① 토종 원스토어는 왜 구글갑질방지법을 돌연 반대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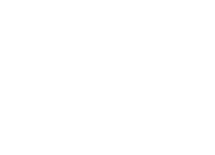
![[AI 비즈부동산] 25년 11월 2주차 서울 부동산 실거래 동향](/images/common/side0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