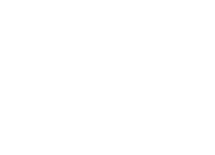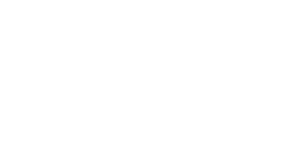“자네는 좀 덜 절박해 보였어.”
모 저널리즘 스쿨 면접 후기다. 자세히 말하자면 면접 후기는 아니다. 중간평가 이후 담당 교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다. 처음에 나를 뽑을 때 ‘나이가 어리다는 점’이 꽤나 걸리셨단다. 교수님이 어떤 단어로 본인의 심정을 설명했는지, 구체적인 표현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난 “나이도 어리니까 덜 절박할 듯하다” 식의 이야기로 해석했다.
선생님의 의도를 좋게 해석해보자. 장수생이 많은 언론고시시장을 생각하면 아직 경험할 일이 많은 나보단, 같은 값이면 좀 더 나이 많은 애를 뽑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군대 갔다 온 남자 나이 27∼28이 중간에서 약간 어린 축인 언시 시장에서 26의 나는 정말 어린 편이었다. 실제로 그 저널리즘 스쿨에서 92년생 여학생 3∼4명을 빼면 40명 남짓 되는 사람 중에 내가 제일 어렸다.
 |
||
불현듯 궁금해졌다. 나이와 절박함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그 선생님은 교수로서 많은 학생을 지도했고, 기자로서 많은 분을 만나셨다. 엄밀하진 않아도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는 유추하셨나보다.
그 견해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들어가는지, 사람 보는 눈에 들어가는지 난 알지 못한다. 다만 나이와 절박함이 그리 강한 연결고리를 가질까 의문스러웠다.
멀쩡히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해 기자 준비를 하는 32세의 형과, 무직으로 꾸준히 기자를 준비하는 28세의 누나 중 누가 덜 절박할까. 10대 때부터 꾸준히 기자를 꿈꿔온 누군가와 대학에서 우연찮게 저널리즘스쿨에 붙은 사람 중 누가 더 절박할까.
절박함이라는 단어에 나이가 가진, 생물연령이 가지는 지분은 얼마나 될까. 궁금하다. 나이가 대체 뭔 상관일까?
“How old are you?”, “I was born in 1991.”
캐나다에 교환학생으로 갔을 때, 내 나이를 묻는 일이 종종 있었다. 외국이라고 사람들이 나이를 묻지 않는다거나, 나이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편견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물론 한국과 외국의 차이는 극과 극이다. 한국은 만 나이를 쓰지 않는다. 만 나이를 쓰려면 몇 월에 태어났는지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나에겐 좀 귀찮았다. 매번 외국 애들이 내 나이를 물을 때마다 “I was born in 1991”라고 답했다.
대부분의 반응은 “이렇게 나이 많은 줄 몰랐다”였다. 물론 그 반응엔 동양 남자의 나이를 가늠하지 못하는 서양 애들과, 왜 이렇게 늦게 교환학생을 왔는지 놀라는 애들이 적당한 비율로 녹아 있었다.
교환학생 때 만난 애들은 한국으로 치면 대부분 20살, 21살이었다. 병역의 의무 때문에 2년이나 늦게 온 나를 보면서 좀 신기했나보다.
그 친구들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달라진 건 없다. 내가 교수한테 쓰는 영어나, 그 친구들이 나한테 쓰는 영어나, 내가 그 친구들한테 쓰는 영어나 다 같은 영어였다.
격식을 차리는 단어 몇 개를 썼을지언정 그건 이메일에서의 예의였지, 연장자에게 보여야 했던 예의와는 사뭇 다르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경험이 많지 않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생각이 깊다는 이야기도 편견이다.
생각은 삶의 질과 삶의 품격에서 나온다. 삶의 질과 품격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생기지 않는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살고, 열정적으로 살수록 삶에 나이테가 생기고 생각이 깊어진다. 삶을 채워주는 복잡다단한 경험은 나이라는 변수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단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 경험이 많을 확률이 아주 약간 높을 뿐이다. 약간 높은 확률을 확정적인 1로 만드는 과정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에 국한된다. 비록 내가 나이를 중요하지 않게 여길지언정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나이를 주요변수로 취급한다.
모두가 나이를 중요시 여기는 현상을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데 아직 바뀌지 않는다. 비슷한 놈이 하나 있다. 회사 회식 말이다. 가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꼭 가게 되는 그런 자리처럼, 고쳐야 하는데 고쳐지지 않는 게 나이문화다.
이런 글을 쓰지만, 정작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형이라 부르고, 누나라 부르고, 존대를 하는 것에는 전혀 불쾌하지 않다. 부담스럽지도 않다. 오히려 그런 말을 잘 하는 편이다. 그와 별개로 그냥 불현듯, 고작 생물학적 연령 하나로 사람의 절박함과 노력이 평가된다는 게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말하고 싶었다.
구현모 필리즘 기획자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