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 소비자학과를 졸업한 이 아무개 씨(24)는 지난 학기 한 전공강의를 수강했다. 90명 정원 중 15명이 외국인 유학생이었다. 이 씨는 자신이 “졸업을 앞둔 고학번인 데다 중국어에 능통하다는 이유로 원치 않은 팀에 구성됐다”며 한탄했다. 내국인 네다섯 명으로 구성된 다른 조와 달리, 내국인 3명에 중국인 학생 후(胡) 아무개 씨가 배정된 것.
이 씨는 “과제 내용을 중국어로 설명해줘도 좀처럼 참여하지 않았다”며 입을 뗐다. “단체 채팅방에서 과제 이야기를 할 때 후 씨의 대답을 두 시간 넘게 기다린 적도 있다”며 “기다림 끝에 나머지 조원들끼리 논의를 마치고 나면 슬그머니 나타나 ‘ㅇㅋ’ 두 글자만 남기고 사라지기 일쑤였다”고 덧붙였다. “결국 옆 팀 친구보다 두 배가량 많은 작업을 떠맡아야 했다”고 한숨을 내뱉었다.
이 씨처럼 외국인 유학생의 소극적인 태도에 반감을 느끼는 재학생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며 혀를 내둘렀다. 이를 단순히 불성실함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문화 차이’도 하나의 변수라는 것이다.

“독재가 왜 나쁜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뭐가 문제죠?” 강의실엔 정적이 흘렀다. 네덜란드에서 온 라스(Lars) 씨의 파격 발언이었다. 그를 잘 아는 조 아무개 씨(23)는 “알고 보니 네덜란드는 국왕이 있더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라스 씨의 ‘튀는 행보’는 미시경제 수업에서도 이어졌다. 옆자리 학생과 떠든 탓에 교수님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독과점에 대해 토론했을 뿐이었다. 토론식 수업에 익숙한 그로서는 궁금한 건 많은데 입을 못 여니 답답할 따름이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라스 씨처럼 서구권 학생이 영어강의를 수강하는 경우는 상황이 나은 편이었다. 문화 차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바로 언어였다.
# 외국인 유학생 배려 부족한 강의실
경영학을 전공하는 중국인 유학생 천(陈) 아무개 씨는 “수업 시간에 단어 검색은 필수지만 그러다보면 금방 뒤처진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직무임배드니스’는 한글과 영어를 합친 말 같은데 ‘직무임-배드니스’인지 ‘직무-임배드니스’인지 찾아야 했다. 느린 타자로 검색을 해보니 ‘직무배태성’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직무’는 알지만 ‘배태성’은 몰랐다. 다시 검색을 이어가지만, 그 사이 교수님은 다른 주제로 넘어가 있다.”
그러면서도 이는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천 씨는 수업 전후에 꾸준히 예습과 복습을 이어가며 진도를 따라잡았다. 조별과제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학기 네 개의 조별 과제에 참여하는 그는 “조금 느릴지라도 조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한다”고 말했다.
학교생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유학생들에 대해선 “한국 학생들의 반감을 이해한다”면서 “언어 문제 때문에 수업을 포기해버리는 친구들에게 공부 좀 하라며 잔소리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8년 4월 기준 총 14만여 명. 2·4년제 대학 학부생만 10만 명이다. 2008년도엔 6만 4000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유학생은 10년 만에 두 배 이상이 됐다. 전공·교양을 불문하고 100명 이상의 대형 강의를 듣는다면 언제나 외국인 유학생을 만날 수 있고, 20명 수준의 소형 강의에서도 이들을 볼 수 있다.
그 중 90%가 아시아 국가 출신이며, 중국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 전체 유학생 중 절반 가량은 중국 학생이다. 얼핏 보기엔 ‘대학 환경의 글로벌화’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현장에서 보고 들은 속사정은 달랐다. 게다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교 차원의 배려나 정책당국의 해법은 없었다. 유학생 관리 제도는 그야말로 ‘자율성의 굴레’였다.
# 교육부·대학은 뾰족한 해결책 제시 못해
지난 4월 30일 교육부에서 내놓은 ‘유학생 표준업무처리요령’은 유학생 선발 절차와 학업지도 등에 관한 업무처리를 표준화하기 위해 작성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도를 제시하기보다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와 같은 추상적인 방향성만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선발·관리 절차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문제는 대학 역시 학생의 자율에 기댄다는 점이다. 국내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고려대학교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을 돕기 위해 내국인 학생과의 매칭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 밖에도 한국어 무료 강의를 제공하지만, 참여 여부는 학생의 의지에 달렸다. 즉 정보력이 취약하거나 학업 의지가 부족한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으로부터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교육부와 학교의 관리 소홀로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탈락률은 갈수록 늘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중도탈락률은 각각 5.0%, 6.3%, 6.6%로 증가세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202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할 방침이다.
이은영 인턴기자
writer@bizhankook.com[핫클릭]
·
[베를린·나] 레전드 공연이 단 10유로! 평생 볼 거 다 보고 가리
·
[단독] '우연일 뿐?' 롯데그룹 부회장, 헌법재판관에게 전세 준 사연
·
필수가 된 자료폐기, 기업수사 증거인멸죄 '필수옵션' 되나
·
지점장 1명 해촉이 '전면전'으로, 메트라이프생명에 무슨 일이
·
[부동산 인사이트] 구축 아파트는 '주차장'부터 체크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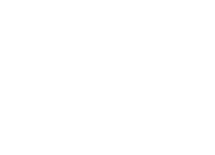
![[AI 비즈부동산] 25년 11월 2주차 서울 부동산 실거래 동향](/images/common/side0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