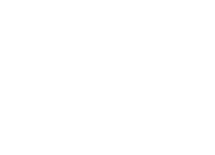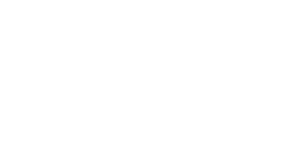[비즈한국] 2023년 연말정산을 하며 처음으로 의료비 이용내역을 세심히 살펴보았다. 60대 중반으로 중증질환을 갖고 있어 최소 한 달에 한 번씩 대학병원 진료를 받는 어머니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의외로 40대 중반의 배우자였다.
그는 연간 22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는데 허리나 손목 등 근골격계 통증으로 회사 근처 정형외과에서 주기적으로 도수치료를 받았고, 감기나 속병(원인은 다양하지만, 주로 전날의 과음에서 비롯된)으로 찾은 병원에서 수액이나 비타민 주사치료 등을 받고 지출한 금액은 실손보험으로 청구해 186만 원을 돌려받았다.
반면 9세와 7세의 어린이 두 명은 환절기마다 빼놓지 않고 각종 호흡기 질환에 걸렸고, 특히 둘째는 1.5개월에 한 번꼴로 장염을 앓아 소아청소년과와 내과의원을 제집 안방처럼 드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둘이 합쳐 75만 원을 지출했다. 연말정산 의료비 명세 속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의료계 파업의 민낯이 보인다.
회사가 많이 모여있는 광화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배우자는 근처 병원을 찾아가면 의사 진료를 받은 이후 ‘실장’이라고 하는 이들과 상담을 한다고 했다. 비타민 수액이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실비청구가 가능한 여러 ‘혼합진료(급여+비급여) 패키지’를 역으로 제안하고, 보험 청구를 위한 제반과정까지 도와주는 사람들. K-직장인이라면 알음알음으로 내 일터 주변의 어느 병원이 그런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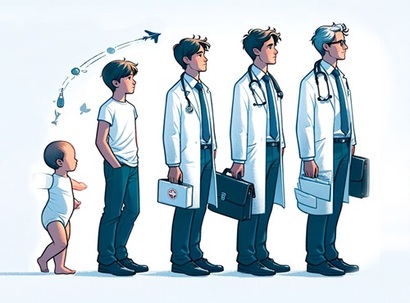
2000년대 이후 실손의료보험이 대중화되면서 개원의들은 대학병원 교수의 연봉을 훨씬 상회하는 소득을 올리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업무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고소득이 보장되는 직업이나 직장으로 사람이 몰리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이치다.
‘진료과별 전문의’ 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더욱 이해가 된다. 수험생 6년(중·고등 6년만 계산했으나 요즘 같은 의대 광풍을 보면 기간이 더 늘어나야 할지도 모르겠다), 의대 6년을 거쳐 12년을 코피 흘려가며 공부를 하다가 국가고시를 보고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비로소 직업인이 된다.
전공 진료과를 선택하기 전에 모든 진료과를 턴별로 도는 인턴과정 1년은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모두 나에게로 떨어지는 시간이다. 의사도 학생도 아닌, 직장인도 아르바이트생도 아닌 신분이다. 병원이라는 일터의 수많은 의료면허인들 구조 속에서 가장 최하층이다. 이 과정에서 이탈하는 인원이 가장 많다. 인턴을 수료하고 나면 어떤 진료과에서 전공의 수련 과정을 시작할지를 정한다. 이 시점에 자신의 ‘미래소득과 지속가능성,구체적인 진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평생직업을 선택하는 일이다.
고소득과 적정한 워라밸, 이후 다양한 경로(개원의/봉직의/교수 등)가 보장되는 직장과 고소득보다는 보람과 소명의식만으로 더 많은 책임과 고된 노동을 감내하며, 수시로 울리는 전화에 ‘온 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직장이 있다면 당신은 어느 곳을 선택할 것인가? 전자는 우리가 지하철역 주변 번화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병원들(정형외과/통증전문병원/안과/ 피부과/성형외과 등)이고, 후자는 대학병원에나 가야 볼 수 있는 소위 바이탈과(응급/흉부(소아심장)/산부인과/외과 등)다.
전공의 수련 과정이 3~4년, 남성의 경우 여기에 공보의 3년이 추가되고 이렇게 6~7년을 ‘잠도 못 자고 최저임금을 받으며, 선배와 교수들의 눈칫밥과 환자들의 폭언과 폭행을 감내하면서 성공적으로 고생 과정을 수료하고 살아남으면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기회가 주어진다.
벌써 20여 년이 지나갔고 나이는 어느덧 30대 중반이다. 비로소 한 명의 ‘전문의사’로서 몫을 하기 시작했고 선택의 시간이다. 대학병원에 남아 전임의(전임교수)를 하면서 가뭄에 콩나듯콩나듯 생기는 ‘정교수 자리’를 기다릴 것인가, 적절히 다른 대학병원의 계약직 자리로 이동할 것인가, 아니면 개원을 해서 그간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 대가를 회수할 것인가.
1번의 선택지는 연봉이 1억 원 남짓이고, 2번은 2억 원이 조금 안 된다. 3번은? 물론 소득구간에 따라 발생하는 고액의 세금과 제경비들을 모두 제하고 나면 실제 통장에 찍히는 돈은 얼마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잘되면 2-3년 만에 입주해 있던 건물을 전부 사거나 새로 올리기도 한다.
그런데 나라에서 ‘패키지 정책’이라며 실손의료보험의 보상체계를 뜯어 고친다고 하니 미래의 기대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의대정원이 늘어나면 경쟁자는 수없이 늘어난다.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는 하지만, 처참한 출생률에 전체 인구는 줄고 있다. 파이는 줄어들고 있는데 나눠 가질 사람은 더 많아진다. 파업 중인 전공의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몇 년만 더 버티면 그간의 고생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하필이면 내 코앞에서 기득권 입성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것이다.
모든 이야기가 기승전 ‘자본, 혹은 돈’으로 귀결되고 마는 우리 사회구조 속에서 ‘돈 잘 버는 것이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 라는 직업관과 노동관이 고착되어 있는 지금. 의대 정원이 증원되면 가장 성행하는 것은 어쩌면 ‘입시 학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전공의들을 우리와 같은 근로자, 직업인으로 치환해 보면 ‘돈을 많이 버는 일자리만 선호’하는 것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몰염치를 말할 것도 아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당연한 것, 원래부터 그런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
필자 김진은?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을 합쳐 3000명에 달하는 기업의 인사팀장을 맡고 있다. 6년간 각종 인사 실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깨달음과 비법을 ‘알아두면 쓸데있는 인사 잡학사전’을 통해 직장인들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김진 HR 칼럼니스트
writer@bizhankook.com[핫클릭]
·
[알쓸인잡] '그들'의 집단 사직서는 왜 설득력이 없을까
·
[알쓸인잡] 휴직⑤ 쉴 때 쉬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
[알쓸인잡] 휴직④ 정신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휴직 가능할까
·
[알쓸인잡] 휴직③ "그런게 있었어?" 가족돌봄휴가, 똑똑하게 쓰는 법
·
[알쓸인잡] 휴직② 남성의 돌봄 경험이 기업 조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