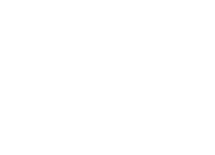[비즈한국] 2015년 방영된 웹드라마 ‘우리 옆집에 엑소가 산다’는 웹드라마 최초로 10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이후 K팝 기획사들이 본격적으로 웹드라마 제작에 나섰다.
기획사들이 웹드라마 제작에 나선 이유는 여럿이다. 일단은 꿈의 실현. 직접 드라마를 제작할 기회였다. 또 K팝 팬들을 대상으로 파생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다변화할 수 있으면서 제작비는 덜 들었다. 드라마 한 편 만들 제작비로 웹드라마는 3~4편을 제작할 수 있었다. 아이돌 그룹의 IP를 드라마 제작사와 복잡하게 계약할 필요도 없었다. 게다가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연기력을 심화하거나 트레이닝하는 과정으로 삼아 연기력 논란을 미리 차단할 수 있었다.

모바일을 사용하는 젊은 세대는 웹드라마 소비에 최적화되어 보였다. 그들은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소비한다. 더구나 한 가지에 15분 이상 집중하지 못하는 ‘디지털 쿼터리즘’이 보편화하면서 분량이 짧은 콘텐츠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놓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숏폼 드라마라는 장르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웹드라마 분량이 10분 정도인 것과 비교해 숏폼은 1~2분 분량이었고 과금 체계는 촘촘했다. 이는 수익 모델의 특징이자 한계를 의미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오히려 특정 분야를 깊이 파고드는 ‘디깅 컬처’를 부각했다. 젊은 세대들이 짧은 콘텐츠만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내용이나 소재라면 긴 콘텐츠라도 상관없다. 특히 모바일 환경은 깊이 파고들기 좋다. 아무리 길어도 정주행 할 만한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웹드라마나 숏폼 드라마는 장르 관점에서 제한된다. 흥미를 끌 내용이 주로 로맨스물에 한정되기 쉬웠다. 로맨스물은 아무리 제작비가 덜 든다고 해도 대중성과 작품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수준 있는 기획력이 필요하다. 더구나 웹드라마나 숏폼 드라마는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리얼리즘 콘텐츠이기 때문에 설정이나 연출에서 현실적인 한계도 있었다.
특히 적은 제작비로 시각적 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K팝 아이돌이 나오는데 노래와 퍼포먼스가 없는 드라마도 있었다. K팝 팬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인데도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K팝 기획사들은 웹드라마와 숏폼 드라마에서 손을 놓기 시작했다. 아울러 전 세계 젊은 세대가 일반 영화나 드라마보다 애니메이션을 즐기는 사실을 간과했다.
얼마 전 나온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문화적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애니메이션의 문화적 가능성을 K팝에 매우 잘 접목했기 때문이다. 메기 강 감독은 코로나 19 팬데믹 속에서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공연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했는데, 나는 가상 보이그룹 ‘플레이브’이 연상됐다.

한국은 가상 아이돌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애니메이션과 연결조차 못 했다.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확인한 것은 가상인간에 대한 젊은 세대의 주목이었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진짜 인물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자신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내용이 있으면 페이크라도 해도 상관이 없다.
한편 젊은 세대도 넷플릭스 등을 통해 몰아보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콘텐츠 가운데 하나가 애니메이션이다. 일본 애니메이션이 한국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계속 흥행한 이유다. 웹드라마 등은 돈을 내고 보는 장르가 아니라 무료 콘텐츠 개념이 강했다. 반면 애니메이션은 돈 내고 볼만한 장르로 거듭나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을 K팝 기획사들은 먼 산 보듯 한 셈이다.
비단 기획사들만의 한계는 아니다. 한국이 워낙 리얼리즘과 판타지의 양 극단에 있기 때문이다. 그 둘을 연결하는 것이 애니메이션이다. 한국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유아나 아동이 보는 장르로 생각하지만,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젊은 세대가 즐겨보는 영어덜트 장르로 간주한다. 이는 산업적 가치를 의미한다.
무엇보다 애니메이션은 실사 콘텐츠보다 더 소구력이 있다. 사람이 연기할 수 없는 장면도 연출이 가능하고, 상상력을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 만화적 상상력을 통해 훨씬 다양한 이야기를 펼칠 수 있다. 짧은 콘텐츠에서 담아낼 수 없는 스토리라인의 심화도 가능하다. 더구나 실제 인물을 반영할 수 있다. 실제 아이돌 그룹의 생김새나 목소리, 나아가 노래와 퍼포먼스도 구현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 멋진 미학적 시도와 완성을 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잘 보여준다.
지금은 생성형 AI 덕분에 만화는 물론 애니메이션 제작도 쉬워져 누구라도 쉽게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CJ ENM은 지난 6월 30일 자체 생성형 AI 에이전트와 이를 통해 제작한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공개한 바 있다. 숏폼 형태의 애니메이션이었는데, 곧 장편도 제작 가능하다.
K팝 기획사들도 애니메이션 제작에 활발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아무리 성공해도 그것은 한국이 만든 것이 아니다. 일본 제작사에 자본과 플랫폼은 미국이다. 한국 스스로 K팝과 관련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지 못하면 죽 쒀서 개 주는 형국이 될 뿐이다.
기획사들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애니메이션 콘텐츠에 대한 한국 전체의 변화와 대응이 필요하다. 젊은 세대는 짧은 것만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진짜 인물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소망을 실현하거나 만족시켜주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점을 콘텐츠 창작의 원칙으로 지향해야 한다.
필자 김헌식은 20대부터 문화 속에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드는 길이 있다는 기대감으로 특히 대중 문화 현상의 숲을 거닐거나 헤쳐왔다.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가 활약하는 21세기에도 여전히 같은 믿음으로 한길을 가고 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writer@bizhankook.com[핫클릭]
·
[K컬처 리포트] 돌아온 방탄소년단, 그들이 보여줄 새로운 스토리텔링
·
[K컬처 리포트] 법원 결정 안 따른 뉴진스, '불리한 행보' 선택한 이유
·
[K컬처 리포트] '어쩌다 해피엔딩' 토니상 수상…제2 토니상 나오려면
·
[K컬처 리포트] 텐센트의 SM 지분 인수에서 진짜 중요한 것
·
[K컬처 리포트] 트와이스가 5세대 걸그룹의 '롤모델'이 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