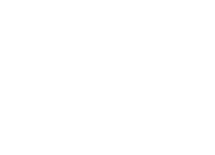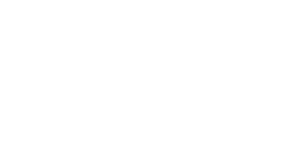[비즈한국] 최근 영화 배급사는 영화 유통뿐 아니라 제작까지 책임진다. 사실상 영화 산업을 움직이는 큰손이다. 국내 ‘빅4’는 CJ E&M, 쇼박스, 롯데엔터테인먼트, NEW(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4개사의 지난해 관객 점유율은 총 44%다. ‘빅4’라기엔 시장 점유율이 낮은 편이다.
영화 배급은 독점이 어려운 산업이다. 위험성이 크고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안목’과 ‘운때’라는 까다로운 요소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대작 영화 의존도가 높은 것도 이유다. 상위 5개사의 배급 편수는 2014년 103편(CJ, 롯데, 소니, 워너, 폭스 순)에서 2017년 71편(CJ, 롯데, 쇼박스, 디즈니, UPI 순)으로 3년 새 34편이 줄었다. ‘웰메이드’ 작품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다. 동시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타격도 크다. 그 예로 기대작이었던 ‘악녀’와 ‘옥자’의 부진으로 NEW는 지난해 메가박스(주)플러스엠에게 ‘빅4’ 자리를 내주어야 했다.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가족’과 ‘사회 정의 구현’ 등 ‘한국적 신파’에 기대어 얼마간 효과를 봤지만, 최근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해 상위 10위권에 오른 외국계 배급사의 국내 시장 관객 점유율이 35.6%를 기록했다. 천편일률적인 국내 영화에 신물 난 관객들이 새로운 영화를 찾아 나선 셈이다.
춘추전국시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객 점유율 집계를 시작한 2003년부터 지금까지 1위 자리를 지켜온 주인공은 CJ E&M이다. 점유율 20~30%를 꾸준하게 유지했다. 업계 2위로 평가받는 배급사는 쇼박스다. 2004년부터 점유율 2위였다. 2010년 폭스에 2위 자리를 한 번 내준 뒤 등락을 거듭한 뒤 2015년과 2016년 연속 2위를 차지하며 저력을 보였다. 지난해 롯데엔터테인먼트에게 자리를 내어주었다가 탈환했다. 2018년 2월 기준, 점유율 1위는 CJ E&M, 2위는 쇼박스다.
상위권 배급사가 10~20% 점유율을 나눠 갖는 와중에 외국계 배급사까지 비집고 들어온 상황을 어떻게 헤쳐갈까? 두 배급사는 해외 시장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작품을 제작하는 데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 ‘계열사 파워로 배급사 살리기’ 김성수 CJ E&M 총괄부사장 대표이사
김성수 CJ E&M 대표(55)는 2011년 취임했다. 미디어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흐름을 읽는 타고난 감각을 지녔다는 평을 받는다. 1990년 제일기획 광고기획 영업국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본격적인 역량을 발휘한 건 신규 사업 아이디어 팀장을 맡게 되면서다.

김 대표는 1994년 ‘투니버스’ 설립과 영화 채널 ‘DCN’, ‘캐치원’을 인수하며 국내 케이블TV 시장을 장악해 나갔다. ‘온게임넷’과 ‘MTV’ 설립을 주도했고, 2001년 온미디어 최고운영책임자(COO) 자리에 올랐다. 온미디어가 CJ그룹에 인수된 뒤에도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업계 흐름을 날카롭게 집어냈다. 한때 ‘온게임넷 프로게임단’ 창단해 자신이 단장에 오르기도 했다. 능력을 인정받아 2011년 CJ E&M 수장이 됐다.
CJ E&M 전체 매출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영화 부문은 적자를 면치 못한다. 지난해 전체 매출은 1조 7500억 원. 전년 대비 13.8% 증가했다. 전체 영업이익은 63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25.8% 올랐다. 반면 영화 부문은 매출 1986억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손실이 90억 원으로 적자다. 2016년 영업손실 239억에 비하면 사정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영화 제작에 들어가는 막대한 제작비용이 부담이다.
영화 ‘공조’, ‘군함도’, ‘남한산성’, ‘1987’ 등을 통해 CJ E&M은 2017년 총 관람객 4045만 명을 영화관으로 끌어들였다. 관객 점유율 국내 1위. 2018년 현재 영화 ‘골든슬럼버’, ‘그것만이 내 세상’을 본 사람이 벌써 250만 명이다. 배급사를 버리긴 아깝고 갖고 있자니 골치 아프다. 김 대표는 이 ‘애물단지’를 CJ그룹 계열사 힘을 바탕으로 어떻게든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CJ E&M과 CJ오쇼핑의 합병이 그 신호탄이다. CJ E&M은 오는 6월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CJ오쇼핑과 합칠 예정이다. 합병비율은 CJ E&M과 CJ오쇼핑이 0.41:1로 CJ E&M이 CJ오쇼핑에 흡수되는 형태다. 두 회사는 각자가 확보한 해외 시장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나아가 CJ 오쇼핑의 ‘캐시파워’로 CJ E&M 사업 확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CJ E&M은 “(영화 부문에 있어) 국내 사업 변동성 축소 및 해외 사업 제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선택과 집중으로 실속 챙기기’ 유정훈 쇼박스 대표
유정훈 쇼박스 대표(53)는 광고기획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1990년 LG애드에서부터 15년간 광고업계에 몸담았다.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간직했던 그는 2005년 돌연 메가박스 상무로 이직을 한다. 능력을 뽐내기 시작한 건 2007년 오리온그룹 계열사였던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쇼박스)로 이동하면서다. 광고기획자로서 쌓아온 특유의 ‘안목’이 그의 능력을 북돋웠다.

이듬해 김우택 쇼박스 대표가 퇴사한 후 NEW를 세우면서 빈자리를 유정훈 대표가 맡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신의 한 수였다. 유 대표는 적자를 면치 못하던 회사를 2013년 흑자로 돌렸다. 쇼박스의 지난해 매출은 1027억 원, 영업이익은 103억 원이다. CJ E&M 등 대부분 배급사가 손실을 보며 속앓이를 하는 중에 쇼박스는 계속 수익을 내고 있다.
유정훈 대표가 쇼박스 수장이 된 뒤 강산이 변했다. 11년째 회사를 운영하며 대표 자리를 굳건히 다졌지만 최근 이상 신호가 잡혔다. ‘논객닷컴’에 따르면 유정훈 대표는 지난 2월 사표를 냈다. 유 대표는 “그런 적 없다”고 일축했지만 쇼박스 관계자는 “갑작스런 사표 제출과 뒤이어 철회”했다고 말했다. 최근 황순일 오리온 감사가 쇼박스 공동대표에 내정됐지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다.
쇼박스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둔 한 해는 2015년이었다. 영화 ‘암살’, ‘내부자들’, ‘사도’,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 등 그해 단 11편만을 배급해 3693만 관객을 동원했다. 영업이익 140억을 기록하며 실속을 단단히 챙겼다. 같은 해 관객 점유율 1위를 한 CJ E&M이 영화 26편을 내놓은 것과 대조적이다. 유 대표는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한 해 18~20편 작품을 내놨는데, 이걸 반으로 줄였다. 대신 작품마다 초기 기획 단계부터 최대한 몰입하는 방식을 택했고, 그런 3~4년간 축적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영화의 위기를 일찍 감지했다. 장르 편중 현상, ‘대박’ 혹은 ‘쪽박’으로 양분화되어 가는 산업 생태계에서 그가 택한 방법은 ‘탈(脫)한국적’ 콘텐츠 생산이었다. 쇼박스는 2015년 3월 중국 엔터테인먼트 회사 화이브라더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같은 해 9월 블룸하우스, 아이반호와 공동제작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러나 최근 쇼박스의 성적은 기대에 못 미쳤다. 2016년 970만 명을 모은 ‘검사외전’, 2017년 1218만 명이 관람한 영화 ‘택시운전사’ 외에 나머지 영화들은 아쉬움을 남겼다. 유정훈 대표는 “쇼박스는 단순한 투자 배급사를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필름 스튜디오(Film Studio)로 거듭나고자 역량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황순일 공동내표 내정자와 호흡을 어떻게 맞춰갈지 관심이 쏠린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틀을 일군 기업들은 창업 1~2세대를 지나 3~4세대에 이르고 있지만 최근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족 승계는 더 이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사회적으로도 카리스마 넘치는 ‘오너경영인’ 체제에 거부감이 커지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당 업종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경영인’ 체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늘고 있다. 사업에서도 인사에서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전문경영인이며 그 자리는 뭇 직장인들의 꿈이다. ‘비즈한국’은 2018년 연중 기획으로 각 업종별 전문경영인 최고경영자(CEO)의 위상과 역할을 조명하며 한국 기업의 나아갈 길을 모색해본다.
박현광 기자
mua123@bizhankook.com[핫클릭]
·
금융당국 지적에도 신한금융 사외이사 '재일교포 중용' 논란
·
[CEO 라이벌 열전] '30년 터줏대감' KEB하나 함영주 vs 우리은행 손태승
·
[CEO 라이벌 열전] 영업고수의 CU와 물류전문가의 GS25 '편의점 대전'
·
[CEO 라이벌 열전] '너는 내 숙명' 한국콜마 윤동한 vs 코스맥스 이경수
·
[CEO 라이벌 열전] '빅3 추격자' NH농협생명 서기봉 vs 미래에셋생명 하만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