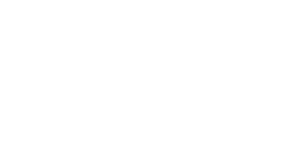[비즈한국] 1년에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는 약 1500만 명. 매년 우리나라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셈이다. 지난 3월 통계를 보면 약 153만 명의 방한 외래관광객 중 중국인이 약 48만 명으로 30%가 넘는다. 1년 통계도 비슷한 비율이다. 한국에 오는 3명의 관광객 중 1명은 중국인이라는 얘기. 하지만 국내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 여행 실태는 여러모로 참혹한 수준이다. 중국 관광객의 방한은 서서히 늘어나는 데 반해, 유커가 다시 들어와도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왜 이렇게 됐을까?

# 제로마진+인두세=덤핑관광의 실체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시장이 참혹한 가장 큰 이유는 여행객이 제대로 된 경비를 지불하지 않고 오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39만 원짜리 방콕, 다낭 여행이 흔한 것처럼 중국 내에서도 저렴한 한국 여행 상품이 흔하다. 비행기표 값도 되지 않는 돈으로 3박4일, 4박5일간 한국을 여행하고 돌아간다. 우리가 해외로 저가 패키지여행을 떠나면, 관광지를 점 찍듯 돌아다니고, 저렴한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쇼핑센터를 전전하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중국인 여행객들도 상당수가 한국에서 이런 여행을 하는 것.
중국 여행객들이 한국에 합리적인 여행경비를 지불하지 않고 오는 이유는 애초에 모객을 저가로 하기 때문이다. 사드 보복 이전에는 저가 모객을 해도 쇼핑마진으로 인한 수익은 충분했다.
더구나 면세점에서 주는 VI(볼륨 인센티브)는 구매액이 커질수록 같이 커진다. X 여행사에서 1억 원 매출일 때 커미션이 15%였다면 2억 원 매출이 되면 커미션도 16%로 뛰는 식이다. 보통 면세점에서는 세세하게 VI의 기준을 책정하기 때문에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받고 싶은 여행사의 욕구는 경쟁을 심화시키고 덤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정부, 관광수지에만 초점 “문화가 무너진다”
중국동포 가이드 C 씨에 따르면 이는 도박과 같다. C 씨는 “1% 확률 게임이다. 100팀 중에 1팀은 반드시 터진다는 생각으로 일했다”고 말했다. 1팀만 잘 터져도 몇 달 수입을 벌 만큼 확실한 잭팟이 존재하기도 했다고. 그에 따르면 “한 팀이 들어와 며칠 동안 1억~2억 원을 쇼핑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 그때는 가이드에게도 1000만~2000만 원은 쉽게 떨어진다. 하루 벌이가 1000만 원 단위이니 도박이 아니고 뭐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만큼 유커는 ‘노다지’였고 면세점이나 쇼핑센터에서 주는 커미션이 상당했다.
사드 보복 이후 중국 보따리상인 따이공(代工)이 들어오기 전에는 개개인 유커의 소비가 엄청났는데 그때는 지금은 따이공에게로 가는 커미션이 모두 여행사에게 돌아갔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호황일수록 인두세는 1500위안(약 25만 원)까지 올라갔지만 면세점의 커미션이 그대로 여행사의 수익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남는 장사였다. 면세점끼리도 경쟁 구도였기 때문에 큰 팀을 받기 위해선 면세점의 커미션 경쟁도 있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전국에 있는 여행사는 총 2만 2544개. 그 중 국내외 여행을 모두 취급할 수 있는 여행사는 5197 개. 여기서 다시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취급하는 인바운드 여행사는 대략 1000여 개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드 보복 이후 현업을 유지하는 인바운드 여행사는 현재 100여 개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도 운영되는 곳은 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몇십 억 원씩 ‘돌려막기’를 하다가 무너진 곳들도 많고 이제 유커의 자리를 대신하는 따이공이 대부분의 커미션 수익을 챙겨가는 시장에서 재미를 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바운드 여행업을 하다가 전업한 D 씨는 “혹 사드 보복이 풀린다고 해도 시장이 예전처럼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쇼핑품목이었던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사그라졌고 중국에서 쇼핑 여행에 대한 유행도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
또 다른 인바운드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인의 한국 저가 관광은 여러 모로 사라지기 어렵다. 다시 중국 인바운드 여행이 활성화 된다고 해도 저가 관광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경복궁은 안가도 명동은 꼭 가야하는 것이 한국여행이라는 것.
여행업계 관계자는 “덤핑도 문제지만 그런 여행을 하고 돌아가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겠나. 경복궁을 본다고 해도 그런 가이드에게 어떤 설명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이런 문제들을 외면하고 있다. 방한 외래여행객 숫자와 관광수지에만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한국 인바운드 여행 시장은 돈은 될지언정 문화적으로는 소리 없이 무너질 것” 이라고 경고했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bizhankook.com[핫클릭]
·
'유커 희망고문' 엇갈리는 인바운드-면세점 업계 속사정
·
'전면전 롯데 vs 용병 신라' 한국 호텔들의 색다른 베트남 상륙작전
·
베트남 다낭은 어떻게 한국인 '최애' 해외여행지가 됐나
·
입국장도 접수한 SM면세점, 하나투어 '패키지 위기' 돌파구 될까
·
글로벌 여행 앱, 한국에서 세금은 내고 장사하시나요?





















![[단독] '고의상폐 의혹' 대동전자, 직원 줄었는데 급여 4배 폭증 '수상한 정산'](/images/common/list01_guide0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