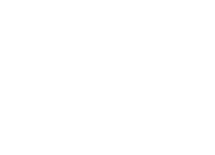[비즈한국] 요즘 시장을 보면 마치 ‘모든 게 오르는 세상’ 같다. 국내 증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기대감에 힘입어 연일 고점을 경신하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금값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비트코인은 미국 증시 상승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 속에 다시 불이 붙었다. “뭘 사도 오른다”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복합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낸 ‘에브리씽 랠리(Everything Rally)’라고 부른다. 그러나 시장이 가장 뜨거울 때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위험했던 때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들도 있다.

iM증권에 따르면 지금의 상승은 경기 회복보다는 AI 생태계 구축과 유동성 확대, 신용위험 안정이라는 세 가지 요인에 기반한다. 미국 중심의 AI 공급망 재편, 엔비디아·오픈AI 같은 핵심 기업의 동반 성장, 일본의 ‘사나에노믹스’가 촉발한 엔화발 유동성이 시장을 밀어 올렸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주요 경제지표가 발표되지 못하는, 이른바 ‘깜깜이 경제’ 속에서도 자산은 오르고 있다. 금리는 안정되고, 신용스프레드는 좁혀지고, 돈은 다시 위험자산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이 랠리는 실물 경기보다 정책 기대감과 심리의 산물이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글로벌 경기가 소걸음을 하고 있지만 주요 자산가격의 랠리는 AI 생태계 구축과 유동성 힘에 기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역사는 이와 비슷한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줬다. 2000년대 초 닷컴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1년 유동성 랠리 모두 ‘기대가 실체를 앞섰을 때’ 시작됐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던 2000년, 사람들은 “이번엔 실체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속도보다 투자자들의 탐욕이 커지는 속도가 더 빨랐다. 결과는 폭락이었다. 2008년에는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확신이 있었고, 금융공학과 레버리지가 합쳐진 탐욕은 결국 금융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렸다. 2021년엔 제로금리와 대규모 유동성이 모든 자산을 끌어올렸다. 주식, 부동산, 코인, 미술품까지 모두 오르며 ‘신세계’가 열렸다고 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자 그 신세계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물론 이번 사이클의 차이는 기술 혁신의 실체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AI가 가져올 생산성 혁신은 분명 현실이다. 그러나 ‘혁신의 속도’와 ‘수익의 속도’는 다르다. 2000년대의 인터넷도 실제로 세상을 바꿨지만, 버블이 터진 후 10년 동안 투자자들은 잃은 돈을 회복하지 못했다. 즉, 기술이 옳다고 해서 주가가 영원히 오르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유동성의 불균형이다. 정책금리는 멈췄지만 실질금리는 여전히 높고, 기업 실적은 둔화하고 있다. 돈은 풀리지 않았는데 기대만 앞서는 장세, 이것이 바로 버블의 전형적 초기 국면이다. 그만큼 작은 충격에도 시장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금융시장의 위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인간의 탐욕은 반복되기 때문이다. 탐욕과 공포의 줄다리기 속에서 탐욕이 승리할 때 시장은 버블을 형성하고, 공포가 이길 때 시장에는 위기가 찾아온다. “금융위기는 10년마다 온다”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9만 4000원대가 되면서 오랫동안 속앓이를 하던 투자자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드디어 구조대가 왔는데, 구조되고 싶지 않아졌다”는 우스갯소리도 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확신이 아니라 대비다. “지금 안 사면 늦는다”는 조급함보다 “지금이 마지막 파도일 수도 있다”는 냉정함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부는 “연말엔 다 팔아야지”, “내년 초엔 현금화해야지”라며 경계심을 드러낸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망설인다. “다 오르는데 지금 팔면 바보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팔지 말라” 혹은 “팔아라”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보느냐의 문제다.
에브리씽 랠리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누구도 모른다. 실물경제의 체력 없이 자산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고점’이라고 단정하기엔 이르지만, 이번 랠리를 ‘구조적 회복의 증거’로 보기엔 위험하다. 앞으로 금리 인하 기조가 흔들리거나 한·미 관세 협상이 결렬되는 등 거시 변수에 따라 시장은 크게 요동칠 수 있다.
예전 증권가엔 “증권사 객장에 아이를 업은 엄마들이 나타나면 주식시장은 버블”이라는 말이 있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두가 투자에 뛰어들 때 시장은 늘 정점에 서 있었다. 버블 붕괴의 피해를 줄이려면 “내가 모르는 분야에는 투자하지 말라”는 워런 버핏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시장은 언제나 “조금만 더”라고 생각하던 시점에 무너졌다. 에브리씽 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끝날 때의 충격을 감당할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한다.
김세아 금융 칼럼니스트
writer@bizhankook.com[핫클릭]
·
[가장 보통의 투자] 희비 엇갈린 카카오·네이버, 플랫폼 경쟁 어디로 가나
·
[가장 보통의 투자] 코스피 '하드캐리'하는 반도체 랠리 "시작일까 끝물일까"
·
[가장 보통의 투자] "SKT 해킹에 KT 유령기지국까지…" 통신주, 정말 방어주 맞아?
·
[가장 보통의 투자]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우리 기업에 던진 숙제
·
[가장 보통의 투자] 사상 최대 과징금 맞은 SK텔레콤, 주가는 왜 흔들림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