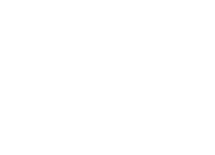[비즈한국] “외국에서 고생하는 한국인 노동자가 있듯, 국내에서도 고생하는 이주노동자가 있다. 역지사지해야 한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체포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역지사지의 자세로 국내 이주노동자의 처우와 인권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우리나라에서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이 제한된다. 이는 ILO(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이에 시민사회는 이주노동자 착취를 방지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26일 법무부에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조선 용접공 이주노동자 A 씨의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근무처 변경 허가 사유의 구체적 기준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A 씨는 2024년 2월부터 HD현대미포 하청업체인 울산 남구의 B 사업장에서 일했다. B 사업장은 당국에 제출한 표준근로계약서와 다른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A 씨에게 일을 시켰다. 임금은 월 250만 원에서 시급 9900원으로, 근로계약 기간은 12개월에서 8개월 25일로 줄었다. 근로 장소도 ‘변경 불가’에서 ‘가능’으로 바뀌면서, 선박 블록 용접 업무가 용접을 위해 선체 블록을 고정하는 작업으로 변경됐다. A 씨는 일하던 중 전치 3개월 이상의 부상을 입었으나 사업주의 만류로 산업재해 보상을 청구하지 못한 일도 있었다.
결국 A 씨는 올 3월 근무처를 바꾸기 위해 법무부에 구직활동 체류자격인 D-10-1 비자로 변경신청을 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다. A 씨의 귀책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선 용접공 체류자격(E-7-3) 지침은 이주노동자의 귀책 사유가 없을 때만 근무처 변경이 허용된다. 이에 A 씨는 지난 4월 권익위에 근무처 변경 허용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 사안이 이주노동자의 귀책이 없는 근무처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재성 권익위 서기관은 “법무부는 단순히 사직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로 귀책 사유에 이견이 있다고 봤다”며 “그러나 이면계약 강요와 산재 신청을 막는 부당한 처우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A 씨는 “실제로 구제되어 체류자격이 주어지려면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며 “아직 법무부가 조처하지 않아,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이주노동자의 귀책이 없는 근무처 변경 허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했다. 현재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인 E-7의 근무처 변경 관련 지침은 ‘ 휴·폐업,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조항밖에 없다.
정영섭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활동가는 “법무부 출입국이 자의적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해 사업장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권익위의 이번 권고는 고용허가제 고시 수준에서라도 근무처 변경 허가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게 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시민사회는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이주노동자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7 비자와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사업장 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비전문 인력 취업 비자인 E-9 역시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폐업하는 등 사업주에 귀책 사유가 있거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이주노동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2021년 비준한 ILO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 관련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협약 제29호는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또 이주노동자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내몬다. 김현주 울산이주민센터 센터장은 “사업장 변경 제한은 저임금과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이주노동자가 계속 일하도록 만든다”며 “E-7-3가 사업장 변경이 안 되는 점을 숨기고 사업주가 다른 사업장을 소개해준다며 사직서를 받아 근로계약을 만료하는 악용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외국인 전문인력 제도를 전부 공공이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노동부가 관할하는 고용허가제와 달리 E-7 비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전문인력 제도는 이주노동자 모집과 송출을 민간이 맡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주노동자 송출과정에서 현지 에이전시와 브로커가 개입한다. 이주노동자는 보통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가량을 브로커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현주 센터장은 “브로커와 같은 지하 산업이 번성하는 현장을 눈으로 보게 된다”며 “이주노동자가 빚을 갚으려면 2년은 일해야 하는데 1년 만에 계약이 만료되면서 미등록 이주민이 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공공에서 맡는 영역은 법무부의 비자 발급과 근무처 변경 허가 정도다.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는 법무부만 제도에 관여하면서 노동적 관점이 빠져있다고 지적한다. 정영섭 활동가는 “법무부는 관련 단체의 문제 제기를 듣지 않는다”며 “적어도 고용허가제처럼 노동부가 1차 관할기관이 되어 이주노동자 송출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호 기자
goldmino@bizhankook.com[핫클릭]
·
[현장] 비닐하우스가 집, 화장실은 고무대야…외국인 노동자 숙소 가보니
·
마스크도 재난지원금도, 외국인은 소외되는 까닭
·
한국노총 "고의 상습 체불 사업주 강력히 처벌하라"
·
올들어 16만6천명 노동자 7800억 임금 체불
·
울산노동단체 "재해다발 세진중공업 대표이사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