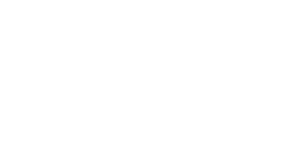[비즈한국] 보건당국이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 관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월 초 밝힌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병상 공동활용 제도를 폐지하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병상 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웃돈을 주고 병원 간 병상을 사고파는 등 남용을 방지하고, 과잉 공급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일부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보건복지부는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장비 공유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금은 병상 공동활용 등을 통해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 설치가 가능한데, 이를 폐지할 계획이다. 병상 수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 장비 공유기관 간 영상정보 전송을 지원하고, 장비공유 관련 수가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병상 공동활용’ 제도는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병의원이 인근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빌려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수의료장비 활용의 효율을 꾀하기 위해 시작됐지만, 웃돈을 주고 병상을 사고파는 일이 벌어지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일부에서는 병상당 약 100만~150만 원에 거래하며, 병상이 하나도 없는 병의원에 장비가 설치되는 등 편법 거래도 의심되고 있다. 여기에 인구 대비 의료장비 비율이 높고,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나타나자 보건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제5차 국민 보건의료 실태조사(2020년 기준)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이 보유한 CT는 2080대, MRI는 1744대로, 인구 100만 명당 CT 40.1대, MRI 33.6대에 이른다. OECD 평균인 CT 25.8대, MRI 17대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기기가 늘면서 진료비도 증가했다. MRI 진료비의 경우 2018년 513억 원에서 2019년 5248억 원, 2020년 5282억 원, 2021년 5939억 원으로 3년 사이 10배가량 늘었다.
개원의 사이에서는 이 계획이 시행되면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상대적으로 병상 수 확보가 어려운 1, 2차 의료기관은 진료가 어려워져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적시에 적정인에 의해 적소에서 적정 진료’를 받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CT나 MRI 촬영 없이는 정확히 진료하기 어려운 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높다. 진료 과목에 따라 특수의료장비 촬영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병상 공동활용 제도를 없애고 병상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규모가 작은 병원은 아예 진료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신경외과 개원의 A 씨는 “MRI와 CT 운영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진단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뇌를 주로 보다 보니 특수의료장비 없이는 정확히 진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지금도 종합병원은 환자가 많아 MRI나 CT를 찍으려면 예약하고 며칠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바로 갈 수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병상 공동활용 제도가 폐지되면 동네 소규모 병원에서는 진단을 할 수 없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개원의협의회에서 두 번이나 공문을 보내고 만남을 요청했어도 복지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으니 결정되면 만나자’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결정되기 전에 만나 유예기간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bizhankook.com




















![[단독] 아우디, 7만대 리콜한다](/images/common/list01_guide0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