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패션 산업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산업’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지만, 한국에서 이 같은 상황을 바꿀 논의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기후 위기 시대가 도래해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이 경영 방식까지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데도 말이다. ‘패션피플(패피)’은 ‘최신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트렌드에 민감한 이들은 패스트 패션을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비치지만, 이제는 환경과 기후위기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기반해 소비하는 ‘그린 패피’로 달라지고 있다. ‘그린 패피 탐사대’는 새로운 패피의 눈으로 패션을 비롯한 일상의 환경 문제를 파헤치고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작년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패션쇼 장면이 있다. 2023 S/S 코페르니 파리 패션위크에서 모델 벨라 하디드 몸에 ‘하얀 스프레이’가 뿌려졌다. 모델 몸에 뿌려진 스프레이는 곧 천으로 변해 드레스가 됐다. 이는 ‘페브리칸(Fabrican)’이라는 신물질로, 공기에 닿으면 액체에서 섬유로 바뀌는 특징이 있다.
파격적인 퍼포먼스와 신기술이 합쳐진 쇼가 큰 화제를 낳은 것이다. 4월 29일 서울 잠수교에서 열린 2023년 프리폴 여성 컬렉션 패션쇼, 5월 16일 경복궁에서 진행된 구찌 2024 크루즈 패션쇼 등 최근 국내에서는 독특한 방식으로 명품 브랜드 패션쇼가 진행돼 인기를 얻었다.

1860년대부터 시작된 패션쇼는 애초 소규모 이벤트로 구매자들을 대상으로만 진행됐지만, 1960년대 즈음부터 다양한 퍼포먼스를 가미한 대규모 패션쇼가 열려 대중에게 주목 받기 시작했다. 현재는 패션쇼가 패션 산업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패션쇼는 다음 시즌의 컬렉션을 선보이는 역할을 넘어 미래 기술이나 사회적 가치를 담기도 한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시즌마다 개최되는 패션쇼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매년 2~4회 새로운 컬렉션을 공개하는 패션쇼가 패스트 패션을 주도한다는 비판 때문이다. 코로나로 온라인 행사가 진행됨에 따라 오프라인 패션쇼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매년 4회 컬렉션 발표…패션 산업 주도하지만, 환경오염 ‘주범’
매년 시즌마다 패션쇼에서 공개되는 새로운 컬렉션은 의류 디자인에 반영된다. 업계 관계자 A 씨는 “매년 런웨이를 위해 여러 개의 컬렉션을 만든다. 독특하고 창조적인 작품과 시스템을 만들기엔 업계 사람들은 대부분 번아웃 상태다. 현장에선 지금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쉽지 않다. 패션쇼의 성공 여부가 매출을 좌지우지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B 씨 역시 “패션쇼에서 6개월 먼저 공개된 시즌 컬렉션을 바탕으로 그 시즌의 트렌드가 정해진다. 이 트렌드는 명품 브랜드부터 보세의류까지 반영된다. 시즌마다 새로운 디자인의 옷들이 쏟아진다. 트렌드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재고품은 잘 팔리지 않는다. 패션쇼가 패스트 패션을 주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패션쇼를 시작으로 대량 생산된 의류들은 대부분 폐기된다. A 씨는 “한 시즌에 나온 디자인을 바탕으로 생산된 제품들은 2년 정도 여러 매장을 돈다. 마지막 아웃렛까지 가서도 팔리지 않은 상품들은 폐기된다. 정확히 통계를 내긴 힘들지만, 생산 의류의 절반가량이 버려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는 기부를 하거나 재활용하지만 대부분 소각된다. 이런 일이 매 시즌 반복된다”고 말했다.
의류와 섬유 생산은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의복 생산비는 8조 34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의복을 제외한 섬유 국내 의류 생산량은 11조 75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이렇게 생산된 옷들은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생활폐기물로 버려진 폐의류·섬유는 53만 90톤이다. 이 중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매립된 양이 35만 1097톤에 달다. 산업폐기물과의 혼합 배출로 인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양을 고려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2019년 산업폐기물로 버려지는 폐의류·섬유는 하루 68톤에 달했다.

자연히 패션 업계의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줄리안 퀸타르트 유럽연합 기후행동친선대사는 “패션쇼에 참여했다가 대량의 폐기물이 버려진 모습을 봤다. 패션 업계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시즌이 지난 물건들이 버려진다는 점이다. 매일 새로 만들어지고 매일 버려진다. 친환경 소재로 만든 옷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비 자체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패션 업계는 신제품 마케팅을 통해 새 옷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새로운 옷을 원하게 만든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의 패션쇼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가치 반영한 이벤트로 변해야
패션 업계가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가치 반영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근에는 업사이클링 패션쇼나 기후위기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패션쇼가 개최되기도 했다. 기존에는 패션쇼가 유명 브랜드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지자체나 학생, 시민단체도 패션쇼를 개최한다.
지난 6월 5일 서울시는 한국소잉디자이너협회와의 협업으로 ‘제로웨이스트 패션쇼’를 개최했다. 업사이클링 콘셉트로 폐기물 등을 활용해 환경의 중요성을 패션쇼로 환기한 것이다. 서울시는 “환경의 날을 맞아 그동안 불편하게 느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패션쇼의 방식이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그 기능이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류산업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C 씨는 “업사이클링 의류 등 폐기물을 활용한 의류 산업에 관심이 많고, 패션 업계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패션쇼 역시 시즌별 의류를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를 보내는 창구로 이용해야 한다. 기존 컬렉션 공개에 ESG를 가미하는 형태가 아니라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전했다.
오프라인 패션쇼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프라인 패션쇼 대신 온라인 생중계나 동영상 등으로 대체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 D 씨는 “코로나 때 대혼란을 겪으면서 패션쇼 자체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특히 SNS가 활발해지면서 앞으로 오프라인 패션쇼가 없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고 말했다. 실제로 명품 브랜드 버버리는 디지털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매년 4회 진행하던 패션쇼를 2회로 줄였다.
업계 관계자 E 씨는 “아직까지 패션쇼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컬렉션이 공개되더라도 종사자가 아니면 잘 모를 수밖에 없는데, 패션쇼를 통해 대중의 관심을 유도한다. 오프라인 패션쇼만의 매력도 분명히 있다. 다만 소비자 선호 없이는 패션쇼가 지속될 수 없으므로 사회적 가치나 환경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플루언서 F 씨는 “여러 패션쇼에 초청 받아 참여한 경험이 있다. 패션쇼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는 단순히 옷의 디자인을 보여주는 형식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나 미래를 반영하기도 한다. 폐기물을 재활용한 쇼도 종종 볼 수 있다. 지금의 패션쇼는 컬렉션 공개보다는 하나의 이벤트 같다. 시즌마다 새로운 디자인을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발성으로, 의류 그 자체가 중심이 아니라 의류를 통해 미래 기술 등의 메시지를 던지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핫클릭]
·
[그린 패피 탐사대⑫] 자동차 '재활용률 90%'는 근거 부족…'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기약 없어
·
[그린 패피 탐사대⑪] '낚시스타그램' 인싸 늘자 바다·강은 망가졌다
·
[그린 패피 탐사대⑩] '다꾸' 유행 뒤에 남은 포장지는 어디로…
·
[그린 패피 탐사대⑨] 캠핑족 감성샷 뒤에 남은 건 '쓰레기와의 전쟁'
·
[그린 패피 탐사대⑧] 힙한 '고프코어룩' 유행할수록 지구는 고통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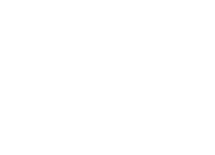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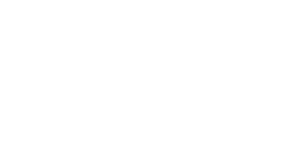
![[단독] 홈페이지 닫는 노르디스크, 철수 아닌 유통망 재편](/images/common/list01_guid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