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법원이 2심에서도 중대산업재해 발생현황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중대산재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한 번 더 확인했다. 시민사회는 안전한 일터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받은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서울고등법원(제9-3행정부)은 10월 2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대산재 관련 기업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24년 10월 17일에 내린 판결에 이어 연이은 승소다.
정보공개센터는 2023년 3월 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원·하청 기업명 △담당 감독관 △행정조치 내역 △송치의견 등이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센터는 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2023년 10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중대산재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을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인 범죄 관련 정보나 수사 진행 정도 및 수사 방법 등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에 수사 기관의 수사 활동이 위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 중대산재 공표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정보공개 청구는 추구하는 목적이 다름으로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다. 중대산재 공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노동부가 중대산재로 범죄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을 공개하는 제도다. 시민사회는 공표 시기가 뒤늦어 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 왔다. 공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발생 시점에 공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전부 인용했다. 김예찬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법원이 이미 두 번이나 정보공개의 정당성을 확인했고, 노동부 스스로 정기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만약 고용노동부가 상고를 통해 정보공개를 지연시킨다면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내용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며 시민의 알권리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부는 이번 판결과 별개로 산재 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도 추진한다.
이경제 노동부 중대산업재해수사과 과장은 “중대산재 기업명의 공개 시기와 세부 내용은 검토하고 있다”며 “대국민 공표와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공표 범위의 차원이 다르기에 별개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중대산재의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해외에서는 중대재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공개하고 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일터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6개월 이내에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의 기업명, 주소, 사고 내용, 법 위반 및 과태료 부과 내역 등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한다. 사고 조사가 완료되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발생 시기 △기업명 △조사 내용 등을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영국 보건안전청(HSE) 역시 보건안전법을 위반한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한다. 기업명과 그 기업의 법 위반 이력 등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중대산재 공표가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되고 게시 기간이 1년으로 한정돼 데이터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민호 기자
goldmino@bizhankook.com[핫클릭]
·
ILO도 지적한 '강제노동'…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이대로 괜찮나
·
"체불·산재·괴롭힘 없는 회사" 정부 '착한 기업 인증제' 실효성은?
·
[중대재해처벌법 3년] 산재 막을 '작업중지권', 발동 실태조차 모른다
·
대통령 '산재 질타'에 대법원 중대재해법 양형 기준 만드나
·
[중대재해처벌법 3년] "죽음의 외주화 끝낼까" 베일 벗은 건설안전특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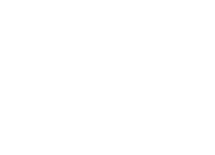

![[단독] 리딩투자증권 지배구조 변화…'오너' 김충호 지배력 커졌다](/images/common/list01_guid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