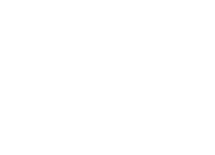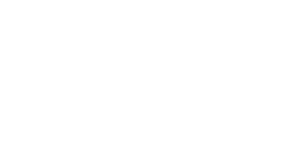[비즈한국] 복숭아가 복숭아지, 품종을 따져가며 먹는 일은 피곤해 보인다. “굳이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먹을 일이야?”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하겠다.
해본 사람만 안다. 먹어본 사람만 안다.
다른 많은 과일과, 심지어 채소도 모두 그렇지만 유독 복숭아는 정말이지 다 다른 과일이다. 과피 털의 유무에 따라 복숭아(peach)와 천도복숭아(nectarine)가 갈리고, 속이 흰 것과 노란 것으로 백도와 황도가 갈리고, 나오는 시기에 따라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갈린다.
물론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딱딱이’인가 ‘물렁이’인가의 차이일 것이다. 그 역시 품종이 가진 특성의 문제다. 여기까지가 무난한 성정의 사람들이 복숭아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하지만 나를 포함한 어떤 사람들은 대옥, 마도카, 유명, 천중도, 장호원, 옐로드림, 신비 같은 복숭아의 품종 이름을 달달 외워가며 먹는다. 위의 특성 외에도 각기 가진 향이 다르고, 단맛과 신맛의 균형이 다르고, 무엇보다도 수확기를 지나치면 한 해치 그 품종을 먹지 못하고 놓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공씨아저씨네’ ‘농사펀드’ 같이 과일의 품종 이름을 당연한 정보로 취급하는 곳들만 알아 둬도 복숭아 생활이 한결 업그레이드되는데, 왜들 그렇게 아무 복숭아나 대충 사먹는지를 이쪽에선 도통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올해는 품종 이름 하나를 새로이 외웠다. ‘광황’이다. 이르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나오는 중생종 복숭아로, 노란 과육을 가진 딱딱한 복숭아다. 물론 물렁해질 때까지 후숙시켜 먹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한다. 털이 무성하게 돋아 있어 박박 닦아 깎지 않으면 식도가 간질간질해지는 품종이다.
이 복숭아를 알게 된 계기에 대해 간단히 얘기하자면, ‘꿩 대신 닭’ 이 아니라 ‘반도 대신 광황’이다. 지난해 취재했던 반도 복숭아 재배 농가에 연락해 그 농장의 거반도 품종 복숭아를 좀 사보려다 얼떨결에 받게 되었다. 지난해엔 분명 구입해 먹었는데 그 사이 겨울에 이마트에서 찾아와 물량을 전부 선매입해 버려 따로 팔 게 없다는 것이었다.
“상품가치는 없는 못난이들이 있는데, 욕하지 않을 거면 반도가 없는 게 마음에 밟혀서 보내주고 싶다”는 이야기였다. 그리하여 받게 된 것이 반도 대신 광황. 멍도 들고 무르기도 했지만 맛과 향만은 마음을 낚아채가는 매력적인 복숭아와의 새로운 만남이었다. 올해는 폭염과 가뭄으로 낙과, 폐과 피해를 입은 복숭아 농가가 많아 일부러라도 못난이 복숭아를 구해 먹을 판이었는데 때마침 잘됐다.
원래 나의 취향은 딱딱하고 새콤한 백도. 복숭아에 대해 조금도 공부하지 않고 아무 복숭아나 사먹던 시절엔 황도를 물렁하고 달기만 한 무매력한 존재로 여겼다. 20세기 어느 시기까지만 해도 귀한 존재였던 황도 복숭아 통조림의 인상이 너무 강했던 탓도 있다.
농장에서 받은 광황은 물렁하고 단맛이 강한 복숭아의 대표 사례였는데(원래 딱딱한 황도이지만, 처음에 후숙되어 무른 것부터 먹었다) 첫인상에서 무지를 깨부숴주고야 만 것이다. 맛, 향이 무르고 달달한 복숭아의 미덕을 단박에 이해시켰달까.
광황은 시장에선 ‘스위트 광황’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원래 당도가 무척 높고 산미가 적으면서 향은 화려한 복숭아 품종이다. 다디단 망고 향과 살구 비누 같은 향, 진한 아몬드 버터 향을 갖고 있다. 코를 대고 맡지 않아도 향이 디퓨저 수준으로 퍼져 나온다. 무척 황홀하다. 복숭아 숲의 원숭이가 될 뻔했다. 올해는 지났으니 적어뒀다가 내년에 꼭 드셔보시라.

그리하여 지금 내 솥에선 냉장고 한 칸을 다 차지하고 있던 광황 복숭아가 보글보글 끓고 있다. 후숙이 끝까지 됐다. 복숭아 무게의 60%가량의 설탕에 시판 무가당 라임주스만 몇 큰 술 넣어 그저 끓이고 있다. 한 시간째다. 복숭아 자체의 당도가 높아 설탕 양을 줄여 잡았다.
안 그래도 강한 복숭아 향은 열과 당을 만나니 한층 넓고 진하게 퍼진다. 여름을 보내는 풍경이다. 복숭아는 부사 같은 사과와 달리 보존성이 없다. 과일을 숙성하는 기체인 에틸렌을 아예 자체적으로 뿜어내기 때문이다. 수확기가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과일이다. 마지막 복숭아가 지나가면 가을의 사과가 온다. 다시 오지 않을 2018년의 여름을 나는 그렇게 보존했다.
가을이 시작됐다.
필자 이해림은? 패션 잡지 피처 에디터로 오래 일하다 탐식 적성을 살려 전업했다. 2015년부터 전업 푸드 라이터로 신문, 잡지 등 각종 매체에 글을 싣고 있다. 몇 권의 책을 준비 중이며, ‘수요미식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먹는 이야기를 두런두런 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음식 관련 행사, 콘텐츠 기획과 강연도 부지런히 하고 있다. 퇴근 후에는 먹으면서 먹는 얘기하는 먹보들과의 술자리를 즐긴다.
이해림 푸드 칼럼니스트
writer@bizhankook.com[핫클릭]
· [이해림 탐식다반사]
조금 더 오래 맛보고 싶은 그 '조기찌개'
· [이해림 탐식다반사]
한여름의 미뉴에트, 콩국수 정경
· [이해림 탐식다반사]
그저 옥수수? 과일처럼 다루면 과일만큼 달다
· [이해림 뉴욕 한식다반사]
'반찬 타파스'의 발칙함, 아토보이
· [이해림 뉴욕 한식다반사]
맨해튼에 일렁이는 '제3의 한식 물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