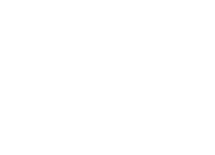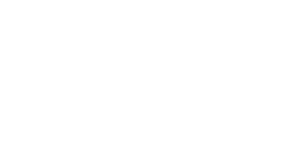[비즈한국] “한 번 먹으면 잊을 수 없는 맛. 게다가 품위까지 있다.” 일본의 자유기고가, 가와우치 이오는 오사카의 유명한 떡집 ‘모리노 오하기(森のおはぎ)’를 방문한 후 이렇게 평했다. 줄 서서 먹는 가게에는 비결이 있는 법이다. 최근 일본 경제지 ‘프레지던트’에 오사카의 명물 떡집 이야기가 실려 소개한다.

일본 오사카부 오카마치에 위치한 ‘모리노 오하기’는 하루 3000개의 떡이 팔리는 인기 가게다. 가게 이름에 붙은 ‘오하기’란 찹쌀과 멥쌀을 섞어 찐 것에 팥앙금을 두르거나 콩가루 등을 묻혀 먹는 일본 전통식 떡을 말한다. 한 입 베어 물면 찐득하게 씹히는 밥알 식감이 매력적이다.
주인장은 모리 유리코 씨(41). 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그는 “내 가게를 갖고 싶다는 생각에 창업을 모색하게 됐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어떤 업종을 선택해야 할지 막연했다. ‘뭘 해야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문득 퇴근길의 즐거움이 떠올랐다. 일하느라 애쓴 자신을 위해 ‘보상’으로 떡을 사먹곤 했던 것. 어느 집의 무슨 떡이 맛있는지 훤히 꿰고 있을 정도였다. ‘맞아, 나는 예전부터 떡을 아주 좋아했어.’
그렇다면 오하기 가게는 어떨까. 잡곡으로 만든 오하기는 몸에도 좋을 것 같았다. 스물아홉 살 모리 씨의 떡 만들기는 이렇게 시작됐다. 먼저 서점으로 달려가 관련 책을 수십 권 구입했다. 매일 집에서 팥을 쑤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누굴 만나든 “내 꿈은 떡 가게를 내는 것”이라고 당당히 말을 꺼냈다. 그동안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었던 그녀에게 이것은 아주 큰 변화였다. 의지를 다지고자 꿈을 이야기한 것인데,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나타났다.
어느 날 친구의 지인이 “카페에서 이벤트로 오하기를 팔아보는 건 어떠냐”는 제안을 해왔다. 즉시 “하겠다”고 답을 했으나 걱정이 들었다. 콩떡이나 팥떡은 세상에 널린, 흔하디흔한 것이다. 이벤트를 한다고 하면 누가 먹으러 와 줄까. 그래서 참신한 떡 모양을 궁리했고, 팥앙금과 콩고물의 맛도 연구의 연구를 거듭했다. 원재료의 풍미와 향을 살리면서도 자신이 맛있다고 납득할 수 있는 ‘달콤함’을 내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2009년 12월 이벤트 날. 준비한 오하기들은 모리 씨 본인이 먹었을 때도 맛있다고 만족하는 ‘자신작’들이었다. 전통적인 단팥과 콩고물에 호두, 호지차, 미타라시(간장베이스 시럽) 등 신작을 더한 여덟 종류를 선보였다. 가격은 모두 100엔(1000원)대. 잡곡을 사용해 단맛을 줄였고, 알록달록한 색감으로 디저트 느낌이 나도록 했다. 사이즈는 여성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아기 주먹만 한 크기로 만들었다.
이벤트는 성황리에 종료됐다. 준비한 200개의 오하기가 완판 된 데다 또 다른 곳에서도 이벤트를 함께 하고 싶다는 제의가 들어왔다. 그날 밤 뒤풀이를 하던 중 한 친구가 “잡곡으로 만든 오하기가 참신하다”며 “누군가 흉내 내 팔 수도 있으니 빨리 가게를 여는 편이 좋지 않겠냐”는 염려를 해줬다.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은 모리 씨는 개업하기로 결심을 굳힌다.
가게를 열려면 장소부터 정해야 한다. 처음엔 오사카 안에서도 번화가에 가게를 낼까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에 1000원대인 떡을 파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 엄두가 나질 않았다. 결국 모리 씨는 거주하고 있는 오카마치 근처 상가로 정했다. 등잔 밑이 어두웠다. 마침 혼자 시작하기에 딱 좋은 아담한 크기의 가게가 매물로 나와 있었다.
인테리어는 복고풍 콘셉트를 적용했다. 판매하는 떡들이 전통에서 조금 변형됐기 때문에 오히려 가게 디자인은 친숙한 풍경이 좋을 것 같았다. 골동품점에서 구입한 찬장을 가게 앞에 늘어놓았고, 유리 또한 레트로 느낌이 나는 것으로 끼웠다.
2010년 7월 7일. 드디어 모리 씨의 떡집이 문을 열었다. 2시간 만에 350개 이상의 오하기와 와라비모찌(고사리 전분 찹쌀떡)가 매진됐으며, 상승세는 계속 이어졌다. 당시 모리 씨는 혼자서 떡을 만들었기에 매진되면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개업 일주일 만에 모리 씨의 떡집은 ‘바로 문 닫는 가게’로 불리기 시작했다.
입소문을 타고 미디어에서도 ‘행렬이 생기는 떡집’으로 연달아 소개됐다. 한층 더 많은 손님이 밀려왔다. 아무리 떡을 만들어도 순식간에 팔려나가, 남편도 회사를 마친 후에는 집에서 팥을 쑤며 필사적으로 도왔다. 해가 바뀌어도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백화점에서도 납품 제의를 받아 직원을 하나둘 더 채용했다.
2014년에는 오사카를 대표하는 번화가 기타신치에 2호점 ‘모리노 오카시(과자)’를 오픈했다. 떡만 파는 본점과 달리 일본의 전통 과자 카린토를 함께 판매한다. 모리 씨는 “도심부에 가게를 내고 싶었던 이유는 회사원 시절 퇴근길에 오하기를 사곤 했던 추억 때문”이라며 “자신을 위한 보상이나 간단한 선물로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 싶었다”고 전했다. 2호점은 직장인들의 퇴근시간에 맞춰 16시 30분에 오픈한다. 이쪽도 매일 완판 되는 인기 가게로 등극했다.

그로부터 7년이 흐른 지금. 모리 씨는 두 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경영자가 됐으며, 직원도 2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모리 씨의 가게 운영 철칙만큼은 여전하다. 다름 아니라 “내가 먹어서 맛있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떡만 판매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손님 역시 ‘또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맛이 된다고 믿는다.
최근에는 화려한 인테리어와 인스타그램 감성의 디저트 떡집이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모리 씨는 “화제성 만들기는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진짜 맛있는 떡을 고객에게 전하자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다. 아무리 보기에 예뻐도 고객이 ‘한 번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계속 이어질 수 없다. 또 희귀 재료에만 집착할 경우 가격이 비싸진다. 내게 오하기란 서민들의 간식으로, 쓸데없이 비싸서도 안 된다. 적당한 가격 선에서 최고의 맛을 내는 걸 소중히 하고 싶다.” 모리 씨의 경영 원칙이다.
강윤화 외신프리랜서
writer@bizhankook.com[핫클릭]
·
백화점·마트·돔구장까지…롯데 맞선 신세계의 '인천 탈환 작전'
·
[장사의 비결] 동네 채소가게에 직장인들이 줄 서는 이유
·
스타벅스 누른 일본 최고 '사자커피'의 성공 비결
·
'카모메식당은 영화일 뿐' 카페 창업이 실패하는 이유
·
'이것이 식당의 미래?' 일본 미라이식당의 성공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