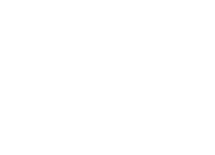[비즈한국] 콘텐츠 흥행 결과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인기 원작에 바탕을 두고 제작하는 것이다. 최근 개봉한 영화 ‘좀비딸’, ‘전독시(전지적 독자시점)’ 모두 인기 웹툰과 웹소설을 원작으로 했다. 하지만 두 영화의 결과는 전혀 다르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무조건 원작에 토대를 둔다고 흥행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이런 결과의 차이는 한국 영상 콘텐츠의 방향타와 맞물려 있다.

원작 기반의 영상 콘텐츠는 개봉 초기에 핵심 팬층을 불러모은다. 2018년 이래 원작 웹소설의 누적 조회수가 3억 회에 이르는 ‘전독시’는 개봉 첫 주에만 40만 명을 동원했다. ‘더 테러 라이브’의 김병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배우 안효섭, 이민호, 나나, 블랙핑크 지수까지 출연했으니 캐스팅 파워도 기대할 수 있었다. 더구나 안효섭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얻은 글로벌 인기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보이그룹 ‘사자보이즈’ 리더 진우의 목소리 연기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대했던 만큼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반면 ‘좀비딸’은 첫날 관객 43만 명으로 영화 ‘극한직업’이 세운 코미디 영화 최고 개봉 성적(36만 8500명)을 넘었고, 올해 최고 흥행작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딩’(42만 3800명)의 기록도 뛰어넘었다. 일주일 만에 손익분기점 220만 명을 가볍게 돌파했다.
‘좀비딸’의 흥행 요인은 무엇일까? 일단 정부가 뿌린 영화 소비쿠폰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 비싼 관람료 때문에 관객들이 영화관을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비등하고, 많은 소비자가 영화 관람료가 만 원 이하인 게 적절하다고 응답하는 상황에서, 6000원 할인 쿠폰은 유효해 보였다. 더구나 문화가 있는 날 할인까지 적용하면 1000원에 영화 관람이 가능했다. 아울러 영화 개봉이 7말 8초 여름 휴가의 시작점인 데다가 한참 무더위가 절정을 이루던 때였다. 이런 점에서는 ‘전독시’가 개봉 시점이 맞지 않은 면이 있다.
하지만 ‘전독시’와 ‘좀비딸’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일단 팬덤의 심리관점에서 다른 양태를 보였다. ‘전독시’는 원작 고증에서 이탈하는 감독의 아티스트 역량 발산에 초점을 맞췄다. 원작과 상당히 달랐고 오히려 감독의 관점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원작의 핵심 팬층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애초에 불리한 결과를 맞을 가능성이 컸다.
반면 ‘좀비딸’은 웹툰 원작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캐릭터의 싱크로율이 높였는데, 밤순(이정은 분)의 사례는 호평일색이다. 여기에다가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은 줄이되 좀 더 개연성을 가미하고 보완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때문에 원작 팬들의 혹평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 앞서 ‘전독시’가 원작 고증을 등한시했다는 점에서 반사 효과를 누리기도 했다.

두 번째는 내용적인 측면이다. ‘전독시’는 정통 판타지 액션물이고, ‘좀비딸’은 가족 휴먼 코미디물이다. ‘전독시’가 세상을 구원하는 거시적 담론을 지향한다면, ‘좀비딸’은 B급 정서에 기반을 둔 미시적인 좀비물이다. 사회적 가치를 장대하게 생각한다면 ‘전독시’가 더 어울릴지 모른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미래 상황을 디스토피아적으로 그려냈기에 비록 결말이 충격을 주어도 유쾌하고 발랄하게 관람할 수는 없다. ‘좀비딸’ 역시 좀비가 창궐하는 세상을 마주하지만 소소하고 일상적인 유머코드를 통해 신파적인 정서와 함께 희망적인 결말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좀비딸은 좀비물의 한계를 극복했다. 어느새 단선적인 좀비 바이러스 감염 서사는 통하지 않게 되었는데, 쿠팡플레이 드라마 ‘뉴토피아’가 이를 보여줬다. 좀비물이 소강상태가 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누구나 바이러스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좀비딸’은 이 경험을 희망적으로 풀어가서 호평을 이끌어냈다.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딸을 보호하고 극복하게 만들려는 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동네 아저씨의 노력이 결실이 보는 이야기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극복 과정과 닮았다. 좀비를 소재로 하지만 전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 즉 온가족이 피서를 겸해 영화관에 갈 동기부여가 가능했다.
더구나 제작비가 110억 원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도 비교적 쉽게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전독시’는 제작비가 300억 원으로 관객 600만 명 이상을 동원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고 있었다. 원작과 다른 관점을 강화하면 오히려 제작비를 낮춰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셈이다. 오리지널 창작은 비용을 낮추고 팬덤을 새로 만들어가는 전략을 펴야 한다. 거꾸로 ‘좀비딸’은 원작에 충실해 핵심 팬층을 확보하고, 결말을 대중적으로 바꿔 더 넓은 팬층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좀비딸’은 관객들이 보고 싶은 내용에 집중한 반면 ‘전독시’는 그렇지 않았다. 적어도 흥행을 생각한다면 무엇을 더 초점에 두어야 하는지 자명하다. ‘오징어게임3’이 팬들에게 상대적으로 외면당한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 그렇지 않다면 최대한 손익분기점을 낮추고 자유로운 창작적 실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영화와 대중 영화의 차이 그 기초 소양아래 이제부터라도 아티스트 거장보다는 팬을 위한 창작자가 K콘텐츠 리메이크의 기본 모델이 되어야 한다.
필자 김헌식은 20대부터 문화 속에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드는 길이 있다는 기대감으로 특히 대중 문화 현상의 숲을 거닐거나 헤쳐왔다.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가 활약하는 21세기에도 여전히 같은 믿음으로 한길을 가고 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writer@bizhankook.com[핫클릭]
·
[K컬처 리포트] 아이돌 좋아하는 20대가 일본 가수에 빠진 이유
·
[K컬처 리포트]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인기가 '코리아니즘' 때문?
·
[K컬처 리포트] SM, 홍대, 명성황후, 시대유감…1995년 한류의 씨앗이 뿌려졌다
·
[K컬처 리포트] 블랙핑크, 이제 '그래미'의 문을 열어라
·
[K컬처 리포트]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한국서 만들어야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