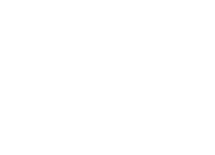[비즈한국] 미국 정부가 국가별로 상호관세율을 새로 적용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 전략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북미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와 현지 생산 압박 등 남은 과제를 안은 반도체·가전 기업들은 제조 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미국 현지 공장의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관세율이 낮은 해외 생산기지를 활용하는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기업마다 관세 리스크 장기화에 대비한 전략 변화가 주목된다.
#반도체 관세 적용 기준에 촉각, 복잡해진 글로벌 공급망
한미 협상 결과에 따라 기존 25%에서 15%로 조정된 관세율이 오는 7일(현지시각)부터 본격 반영된다. 반도체 품목별 관세율은 미 상무부 장관의 예고에 따라 다음 주 중 확정될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의 품목 관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주요 기업들은 세부 조항과 세율, 적용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이 69개국에 조정 상호관세율을 통보하면서 관세 전쟁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각국 생산기지가 엇갈려 있는 현실에다 최종 규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업계가 느끼는 부담은 여전하다.
반도체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MFN·Most Favored Nation)’ 적용을 약속받아 미국 시장 진입에 유리한 여건이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나, 혜택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는 글로벌 분업 체계를 거쳐 생산되는 복잡한 중간재다. 한국의 대미 직접 수출 비중은 106억 달러(약 14조 7117억 원)로 중국(32.8%), 홍콩(18.4%), 대만(15.2%), 베트남(12.7%)보다 낮다. 반면 대만 파운드리(위탁생산) TSMC나 동남아 패키징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물량을 고려하면 관세 영향은 더욱 크다.
MFN 적용의 세부 규정이 실질적인 변수로 여겨지는 배경도 이 때문이다. 이 혜택이 제품 원산지에 기반을 두는 만큼 큰 틀의 약속보다 향후 결정될 세부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홍콩, 대만, 베트남,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다. 이들 국가를 경유해 완제품으로 미국에 도착하는 구조다.
#관세·물류비 고려한 생산기지 대이동 시작되나
‘무관세’였던 가전 수출 영역도 셈법이 복잡해졌다. 관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생산 거점 조정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 해외 생산 기지에 적용되는 관세와 물류비 등 각종 비용을 모두 따져 전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나라에 물량을 집중하는 전략이다.
지난달 31일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상무부 조사 대상에) 반도체 외에도 스마트폰·태블릿·PC·모니터 등 완제품이 포함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사 발표와 반도체 관련 한미 양국 협의 결과 등에 따른 기회 및 리스크를 다각도로 분석해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가전 업계의 주요 생산망이 포진한 인도(25%),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 멕시코(25%) 등은 상호관세율이 각기 다르다. 러시아산 석유를 대량으로 구입한 인도는 25%의 고관세가 예고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율을 더 높게 적용할 수 있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과 인도의 대립각은 한국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니다. 인도는 삼성전자의 전체 스마트폰 생산량 중 최대 30%를 차지하고 LG전자의 주요 해외 생산지 중 하나다.
베트남의 경우 기본 관세율 외에도 변수가 두드러진다. 베트남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자국을 경유하는 중국 환적 물량에 4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동의하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 구상에 동참하는 태도를 취했다.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미국 수출 물량의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으로 묶인 멕시코 공장 등 미국 인근 생산라인은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베트남 지역의 물량을 줄이고, 멕시코 등으로 재편하는 방향이다. 멕시코는 25% 관세가 예고됐다가 90일 유예가 추가됐다. 캐나다는 35%라는 높은 세율이 부과됐으나 USMCA의 ‘자동 관세 면제’ 조항으로 실효 관세율은 비교적 낮다. 블룸버그, 캐나다 중앙은행 등은 두 국가의 실효 관세율을 6.9%로 평가했다.
삼성전자는 멕시코 티후아나, 케레타로 지역에서 TV, 냉장고 등 가전을 생산하고 있다. LG전자는 레이노사와 몬테레이 공장을 운영한다. 지난달 말 열린 컨퍼런스콜에서 LG전자 전무는 “세탁기의 경우 9월부터 멕시코에 있는 멕시칼리 지역에 생산지를 추가 운영해 관세 대응에 유연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장 명료한 해법은 미국 현지화지만, 인건비와 세금, 에너지 관련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면 부담이 상당해 고민이 깊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현지 생산 확대도 주요 시나리오 중 하나지만 속도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미 사우스캐롤라이나·테네시(세탁기) 등 미국 현지 공장 생산 비중을 높이고, 멕시코·베트남·동남아 등지의 생산거점도 최대한 활용해 관세 충격을 분산하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관세 부과는 시장 전반의 가격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트럼프 2.0시대 새 판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격 외에 생산 역량을 담보하는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조달 능력, 프리미엄 제품의 품질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강은경 기자
gong@bizhankook.com[핫클릭]
·
[단독] 이랜드리테일, 정육각에 30억 반환소송 제기…회수 가능성은 낮아
·
[단독] SM그룹 계열사 HN E&C, 범현대가 거래 IT 업체 HNiX 매각
·
'50% 관세 폭탄' 비철금속 중소기업, 솟아날 구멍이 없다
·
[K-바이오 특허 ①] "기회 또는 함정" 넥사테칸 파동이 제약업계 던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