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국가 성장의 기반이었던 산업단지가 빠르게 노후하고 있다. 착공 후 20년이 지난 산단이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2030년이면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낙후된 시설과 산업 구조는 생산성 저하와 지역 경제 침체를 초래할 수 있어 정부는 재생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첨단산업 유치와 공간 다양화를 통해 활력을 불어넣은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2일 ‘2025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활성화구역 공모’를 발표했다. 재생사업은 △기반시설 확충·정비 △첨단화 등 업종 재배치를 지원하며, 선정된 산단에는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 비용으로 최대 5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이와 함께 산단 내 기능을 다양화하기 위한 활성화구역 사업도 병행된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22@BCN 프로젝트’ 역시 주목할 만하다. 낙후된 포블레누 공업 지역을 혁신 클러스터, 대학, 사무실, 호텔, 교육기관 등으로 용도를 전환해 첨단산업과 생활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편했다. 특히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에게 고도 제한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일부 토지를 사회주택·공공시설·녹지로 환원하도록 한 제도적 장치가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해외 사례는 국내 재생사업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김륜희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 용도는 사회적 요구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복합화된 신규 산업 용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과제는 환경 관리다. 노후된 정화시설은 지역 환경오염을 악화시킨다. 실제 울산 산단에서는 노후 지하배관에서 유해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반복됐다. 이 문제는 산단 재생에서 반드시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독일의 ‘IBA 엠셔파크 프로젝트’는 공업지대를 지나는 엠셔강 일대의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오폐수 처리시설을 보강하고, 생활폐수 및 불투수 포장면에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국내 역시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통해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고,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해 관리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김민호 기자
goldmino@bizhankook.com[핫클릭]
·
"판결문이 곧 돈" 공개 범위 두고 법조 시장 '후끈'
·
[현장] 보툴리눔 톡신 균주 '국가핵심기술' 해제 두고 엇갈린 목소리
·
국정자원 화재, 정부24·인터넷우체국 등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 '올스톱'
·
[단독] 실적 악화 이어진 LG생활건강, 천안 퓨처산단 입주 '사실상 포기'
·
LG생건, 천안 산업단지 착공 10년째 '차일피일' 속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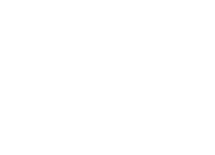

![[부동산 인사이트] '무계획 다주택'의 종말…정책이 강할수록 전략은 단순하게](/images/common/list01_guid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