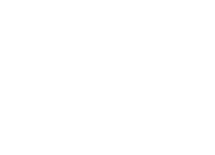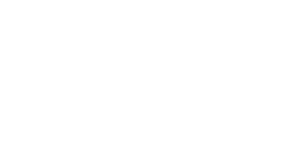[비즈한국] 설 명절이 다가오면 어른들의 머릿속은 복잡해진다. 초등학생 조카에게 세뱃돈을 얼마쯤 줘야 할까. 검색창에는 ‘학년별 세뱃돈 적정가’가 떠 있고, 주변에서는 “요즘 물가에 3만 원은 줘야 하지 않느냐”는 말도 나온다. 5만 원권을 꺼내 들면 괜히 통이 커 보일 것 같고, 1만 원을 넣으면 너무 적은 건 아닐까 싶다. 조카가 둘, 셋이면 고민은 더 복잡해진다. 세뱃돈은 어느새 따뜻한 인사 뒤에 따라붙는 현실적인 계산 문제가 됐다.
하지만 이 질문은 방향을 조금만 틀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 ‘얼마가 맞을까’가 아니라 ‘이 돈이 아이에게 어떤 경험이 될까’로 바꾸는 순간이다. 세뱃돈은 아이가 부모의 관리 영역을 벗어나 처음 접하는 ‘사회적 돈’이다. 평소 용돈은 규칙과 통제 속에서 움직인다. 반면 명절 봉투는 갑자기 생긴 돈이다. 조건도 없고, 기한도 없고, 목적도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세뱃돈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아이에게 주어지는 첫 자유 자금에 가깝다.
이 자유가 문제를 만든다. 초등학생에게 자기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이 주어지면, 대부분은 즉각적인 소비로 흘러간다. 게임 아이템을 한꺼번에 결제하거나, 그때그때 유행하는 물건을 사는 데 쓴다. 며칠 지나면 남는 건 거의 없다. 어른들은 “역시 아직 아이들은 돈을 쓸 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이가 배운 건 다른 것이다. ‘돈은 생기면 바로 써도 되는 것’이라는 경험이다.
더 큰 금액은 또 다른 장면을 만든다. 부모가 개입한다. “통장에 넣어두자”, “이건 엄마에게 맡겨라”는 말이 뒤따른다. 그 순간 돈의 주인은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된다. 아이는 스스로 판단해볼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다시 통제 속으로 돌아간다. 금액은 커졌지만 경제 경험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반대로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돈은 완전히 다른 흐름을 만든다. 사고 싶은 것을 목록에 적어보고, 부족하면 다음을 기다리고, 무엇을 먼저 살지 스스로 정한다. 때로는 충동적으로 써보고 후회하기도 한다. 그 후회 역시 값진 경험이다. 돈이 한정돼 있다는 사실, 선택에는 항상 포기가 따른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우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경제 감각의 출발점이다.
세뱃돈이 비교의 대상이 되는 순간 생기는 문제도 있다.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어느 집 어른이 가장 많이 줬는지가 화제가 되면 아이들은 관계를 자연스럽게 금액으로 재기 시작한다. “많이 주는 삼촌이 더 좋은 삼촌인가?” 같은 단순한 인식이 생길 수 있다. 어른의 의도와 상관없이 돈의 크기가 관계의 척도로 오해되는 장면이다. 이 역시 아이가 배우는 하나의 경제적·사회적 신호다.
그래서 초등학생 세뱃돈의 기준은 물가상승률이나 온라인 평균값이 아니다. 아이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규모인가,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가가 핵심이다. 너무 적으면 경험이 남지 않고, 너무 많으면 통제권이 사라진다. 그 사이 어딘가에 아이가 돈을 다뤄보는 첫 연습을 할 수 있는 ‘적정치’가 있다.
우리는 세뱃돈을 통해 아이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칠 수는 없다. 하지만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기다릴지를 경험하게 할 수는 있다. 명절 봉투는 소비를 키우는 수단이 아니라, 돈을 통제하는 첫 실습 도구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세뱃돈의 문제는 액수의 크기가 아니다. 아이에게 선택권이 있는가, 그 선택을 통해 배울 수 있는가의 문제다. 세뱃돈은 아이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아이가 처음으로 경제를 연습해보는 작은 자본이다.
봉성창
기자
bong@bizhankook.com
[핫클릭]
·
[데스크칼럼] '팔리지 않는 집'은 없다, '바뀌지 않는 정책'만 있다면…
·
[데스크칼럼] 주가·환율·금리 '동반 상승' 한국 경제에 무슨 일이?
·
[데스크칼럼] 쿠팡에게 사과드립니다
·
[데스크칼럼] 쿠팡 3370만 개인정보 노출 사고 "별일 아니다"
·
[데스크칼럼] 트럼프가 일으킨 관세 전쟁, 미국은 진정 '승자'일까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